 |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빠른 인구 감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세계적인 석학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는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 한국이 지금의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지구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08년 UN미래회의가 내놓은 UN미래보고서에서도 한국을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지목하며, 2800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UN은 결론을 내렸다.
또한, 최근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한국은 사라지는가? (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은 극도로 낮은 출산율로 인해 흑사병이 창궐한 14세기 유럽보다 한국의 인구가 빠르게 급감할 것이라며, 한국 인구가 2060년대 말까지 3500만까지 급락하고, 이로 인해 한국사회가 극도의 위기에 빠져들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출산정책 예산으로 약 380조2000억원을 사용했지만, 여성 한명이 15∼49세 가임기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낮아졌고,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까지 추락했고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발표될 때마다 신기록이다. 4분기에는 0.6명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 2006년 한해 출생아수는 45만명대였으나, 올해 출생아수는 25만명대로 감소할 듯하다. 한 해에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2020년을 시작으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15년간 출산정책 예산으로 약 380조2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왜 이렇게 암담한 결과를 낳았을까? 이름만 출산정책으로 해놓고 실제는 출산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일부였기 때문이다. 또한, 저출산의 요인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일·가정 양립곤란(고용 불안정)', '주거 문제', '양육비용', 교육비용(특히 사교육비), ‘복지’, ‘의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필자는 “2030세대의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을 수용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자발적 선택이라기 보다는 사회환경의 강요인 측면도 강하다. 동시대를 사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저출산을 어떻게 막지?가 아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 과거 출산에만 집중하며 출산을 강요하는 출산정책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사회대책으로 풀어야 한다. 모든 국가 정책 전반을 근본 해법의 관점에서 창조적 설계를 해야 한다. 기존의 생각과 정책으로 지금의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창의적인 발상과 치밀하고 과감한 전반적인 사회대책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한 파격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상상을 초월한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줘야 한다. 예산이 없다고? 한국의 GDP대비 가족 지원 예산은 1.56%로 OECD 평균 2.29%에 못 미치며,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2.7%), 스웨덴(3.4%)의 절반 수준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인구절벽으로 국가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저출산, 인구절벽이라는 대한민국의 절대 난제 앞에 나머지 문제들은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저출산ㆍ인구절벽은 좌우 이념을 뛰어넘는 국가적 현안이다. 반드시 동시대에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대한민국의 존속을 기대할 수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너무 절박한 상황이다. 파멸적 상황을 맞기 전에 탁상공론이 아닌 제대로 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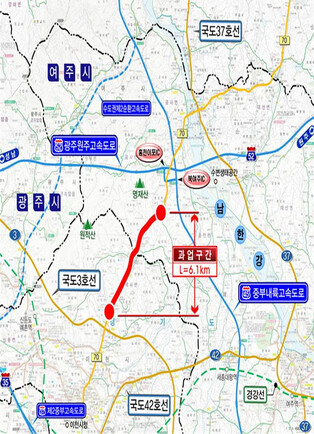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대문구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 심사 돌입](/news/data/20251210/p1160280186940521_40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민선8기 구정 운영 결실](/news/data/20251209/p1160278335594754_91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개조’ 속속 결실](/news/data/20251208/p1160278650914128_30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호원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207/p1160274639826781_60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