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 ||
윤성빈은 16일 평창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남자 4차 주행에서 50초02의 기록을 남겨 1~4차 합계 3분20초55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가슴 졸이지 않은 압도적인 활약이라는 점에서 더욱 빛났다.
윤성빈의 스켈레톤 금메달은 대한민국 올림픽 사상 최초다. 사실 스켈레톤은 루지와 봅슬레이에 비해 국민적인 인지도가 약한 종목이었다. 특히 봅슬레이의 경우 자메이카 봅슬레이팀의 올림픽 도전을 그린 영화 '쿨러닝'을 통해 알려졌지만 스켈레톤에 대해 아는 국민들은 거의 없었다.
동계올림픽의 인프라가 크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스켈레톤, 루지, 봅슬레이와 같은 아이스 슬라이딩 계열 종목의 인프라는 더욱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 종목들은 위험성이 크고, 과학적인 연구와 훈련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도 선수도 부족한 현실이었다.
윤성빈 또한 우연히 선수로 입문할 정도로 선수 수급도 부족했다. 그럼에도 윤성빈은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사상 첫 스켈레톤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분명 기뻐할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윤성빈의 금메달이 종착역이 돼서는 안된다.
김연아가 피겨에서 금메달을 따냈을 때도 기쁨은 극에 달했다. 이후에도 김연아와 같은 어린 별들이 하늘의 별처럼 수도없이 떠오를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연아는 김연아일뿐이었다. 김연아와 같은 선수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지 최근에서야 깨닫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스포츠는 지속적인 투자, 과학적인 연구, 체계적인 훈련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받춰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동계스포츠 인프라가 열악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투자, 연구, 훈련이 기초가 돼야 한다.
겨울이 상대적으로 긴 북유럽 및 러시아, 캐나다는 물론 스포츠 인프라가 탄탄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동계스포츠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4계절이 확실한 대한민국의 경우 동계스포츠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윤성빈과 같은 스타들이 탄생한 것은 천우신조인 것이다.
윤성빈의 금메달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윤성빈의 금메달은 대한민국도 아이스 슬라이딩 종목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작이 돼야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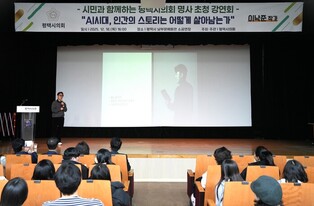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