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일자리 창출사업이란 글자 그대로 경제구조 재편으로 인해 없어진 일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실직자들을 새로운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일부 정책들은 아직까지도 주먹구구식 숫자놀음과 보여주기식에 급급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지자체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유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행정?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기존 취업자들의 보조인력 내지 생계지원 차원의 복지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기 때문.
그는 “근로기간이 1년도 채 안되고 턱없는 임금수준의 행정인턴, 행정서포터즈, 청년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은 정책 목적의 달성이 불투명한 시책과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추진돼 왔던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의 지원책은 단지 통계상 실업률을 낮추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이를 진정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전체 실업률의 두배가 넘고 있는 청년실업과 노숙자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직가장들을 위한 구제책의 마련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들을 위한 정책기조는 인스턴트형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생계가 보장되는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기업들의 적극적 경제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의 완화, OECD 국가에 걸맞는 교육, 환경, 복지정책 실행과 공공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파생되는 새로운 일자리들은 지역발전에 초석이 됨은 물론 성장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
그는 “이제 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사업은 단순한 예산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방향의 모색이 필요할 때”라며 실직가장, 청년실업 구제를 위해 방향성을 찾자고 말했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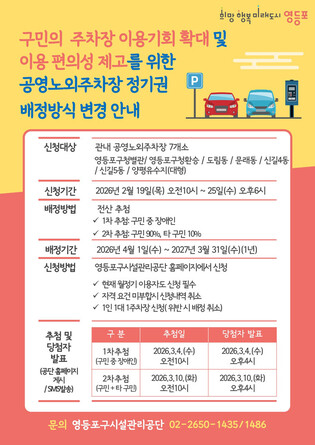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종로구, ‘건강이랑 장수센터’ 통합프로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212/p1160278293995873_90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체류형 관광정책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211/p1160278270104614_373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무안군, 신산업 입지전략 구체화 착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210/p1160278288713250_42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