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헌식 문화평론가)
복고적 문화 행태에 대한 분석은 대개 사회학적 프레임에 따른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청년사회심리학관점에서는 젊었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정체성이 확보되면 언제든 새로운 문화적 현상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계층적 계급적 논거도 단골로 등장한다.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인식과 행태가 현상유지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수적 성향은 쉽게 복고적 행태와 쉽게 결합된다.
하지만 이념적인 성향과는 거리가 있고 생물학적 뇌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예컨대, 회고절정현상(reminiscence bump)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느 정도 단초를 짐작할 수 있다. 이 현상은 35세 이후엔 청소년기나 성인초기 때의 기억을 명확하게 하기 시작하는 양태를 말한다. 특히 노인들에게 자신의 전생애를 자서전적으로 회고하게 할 때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기억이 많이 명확하게 도출되는 현상이다.
최신의 기억이 더 부각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왜 다른 시기도 아니고 청소년기나 성인초기의 기억이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일까.
피츠제럴드(Fitzgerald)는 1996년 관련 논문에서 자기설화가설이론(self-narrative hypothesis)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는 성인의 삶을 앞두고 중요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때에 겪게 되는 경험들이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때의 기억이 명확하게 기억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피츠제럴드는 노인도 이런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대한 회고절정 현상이 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5세이후에 이런 회고절정현상이 일으킨다는 것이다. 35세 이후에는 강력한 기억이나 경험이 부가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더이상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상도 각인이 되는 이벤트도 없다.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과거의 인식이나 경험을 충족하는 행태를 더욱 강하게 한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덜 중요한 기억을 삭제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특정 시기에 불필요한 기억은 삭제하고 중요한 기억은 명확하게 재각인한다고 보아야한다. 이때의 문화적 기억은 강력하게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시기에 들었던 음악이나 영화, 도서, 그리고 인상깊었던 사건이나 인물은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더 명확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선호하는 물건이나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예전보다 범위가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청소년기나 성인초기에 사랑한 여성이나 남성을 잊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문화적으로도 볼 때, 복고풍에 대한 선호가 시작된다. 다른 문화적 기호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었던 청소년기나 성인초기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에 몰두한다.
특히 생활이 안정되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더 부가된다. 자신의 삶에 대한 정당화, 혹은 주체화가 강해진다. 보수화되는 현상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계급과 계층이나 개인의 가치관 이전에 뇌활동에 따른 설명인 것이다. 여기에 또다른 실험은 좀 더 구체적인 임플리케이션을 준다.
버지니아 대학연구팀이 7년간 18~60세 2000명 조사 12개 항목 뇌기능 측정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2세때 최고의 뇌 활동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다가 27세 점차 사고와 시각화 하는 능력이 떨어져 간다. 37세때 기억력이 떨어지고 42세 때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버린다. 하지만, 60세까지는 어휘와 일반상식 증가하는 현상이 보인다.
60세까지 노력하면 트렌드에 대한 어휘와 상식은 증가한다. 22세를 전후하면 왕성한 뇌활동력을 통해 경험과 기억을 축적한다. 그것이 성인초기에 해당한다. 남자들에게는 군대생활이 놓인 시기이다. 남자들이 군대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도 설명할수 있다. 아주 늦은 나이에 군대생활을 한 사람들은 군 생활에 대한 기억을 덜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인간이 22세의 뇌 활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혹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화할 여력이 뇌활동측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고 항상 새로운 것만이 진보요 옳은 것만은 아니다. 기성세대의 문화적 코드는 낡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의 근간이 된다. 유행은 돌고 도는 것. <세시봉>이나 <나가수>의 가수들이 새삼 인기를 끄는 것은 바로 신/구, 본질/파생, 그리고 원작과 리메이크의 상호적 역할과 보완관계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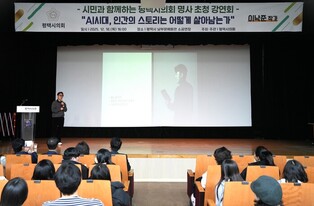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