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문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및 미래주택연구소장)참여정부의 ‘수도권 2기 신도시’ 정책은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다.
참여정부는 강력한 지방분권화를 주장하면서 수도권에 2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모순된 정책을 병행하였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개발하여 서울에 있는 관공서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방분권화로 인해 서울에 거주하던 인구가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신규 건설이 없어도 상승하게 된다는 점은 간과하였다. 주택보급률이 상승하게 되면 주택은 남게 되어 주택시장은 매매시장에서 전세시장으로 바뀌게 되는데 참여정부를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당장 서울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데 임기응변식의 정책으로 수도권에 2기 신도시를 건설하게 된 것이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이라는 모순된 정책으로 크게 피해를 보는 지역은 ‘수도권 2기 신도시’ 지역인 것이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지역에는 두 가지 부류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첫째, ‘수도권 2기 신도시’ 지역의 기존 주택소유자의 피해다. 신도시건설에 따른 주택공급량 증가로 기존의 주택가격은 하락하였다.
둘째, ‘수도권 2기 신도시’를 분양받은 사람의 피해다.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가격이 하락하므로 인해 분양가가 오히려 주택가격보다 높아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 수도권 신도시정책의 흐름을 보자.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노태우정부는 1989년 수도권에 5개 신도시를 선정하여 200만호의 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이 ‘수도권 1기 신도시’로 해당지역은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이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김영삼정부 시절에는 대규모로 신도시건설을 할 경우 이에 따른 폐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각 지역에 맞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소극적인 부동산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주택공급은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부동산완화정책을 실시했다. 이것이 ‘준농림지 개발정책’이며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빼앗지 않고 주택을 건설했다는 장점도 있지만 주택공급이 적었다는 단점도 있었다. 1997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69.6%였고, 1998년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85.4%였다.(경기도의 1997년 주택보급률 자료가 없어 참고로 1998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음)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김대중정부 시절은 I.M.F라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했던 시절이다. 이 시기에 정부는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완화정책을 펼쳤다. 정부는 정부의 관급공사는 축소해야 하는 입장에서 민간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건축’ 대상지의 조기 개발을 초점으로 삼았다. 이때 강남발 재건축대상아파트 지역의 가격이 폭등하는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2002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82.4%였고,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94.2%였다.
2003년에 들어선 노무현정부는 전국적으로 아파트가격이 폭등하자 수도권 2기 신도시를 발표하였다. 성남 판교, 화성 동탄1, 동탄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수원 광교, 송파 위례, 인천 검단, 양주 옥정, 오산 세교, 평택 고덕국제화도시 등 11개 지역에 약 7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약 13년 만에 수도권에 신도시가 건설되는 것이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 서울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미미할 것이며, 과잉공급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2003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4.6%였고,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96.4%였다.
2008년에 들어선 이명박정부는 2009년 서울과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수도권 2기 신도시는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져 서울 인근 그린벨트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2009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4.6%,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96.5%였다.
2012년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했지만 미분양아파트의 존재, 분양가보다 낮은 시세, 기존아파트의 거래 실종 등으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8.4%였다. 2010년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100.1%였다.(경기도의 2011년 주택보급률 자료가 없어 참고로 2010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음)
서울의 아파트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2003년의 부동산정책인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정책은 주택보급률을 비교해 보면 문제점을 갖고 출발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2003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4.6%였고,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96.4%로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2기 신도시’ 지역을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건설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송파 위례신도시를 제외한 10여개 지역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건설되었다는 것은 부동산정책의 당연한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수도권 2기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었다가 손실이 발생했고, ‘수도권 2기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의 기존 거주자는 ‘수도권 2기 신도시’의 입주 물량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다. 이 손실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정부가 주관해서 공사를 하다가 실패한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이 매몰비용은 정부의 책임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국민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다. 정부의 ‘수도권 2기 신도시’의 개발은 민간 건설회사 위주의 개발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를 믿고 분양받은 개인의 손실을 분양받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이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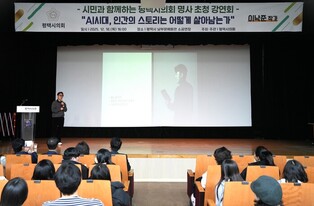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