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와 인천시가 중대한 합의를 한 바 있다. 소위 ‘인천 서울 공동협력 합의문’으로 명명되었다.
하지만 이 공동협력 합의문의 요지는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 보상금 1025억원을 201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순차적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11년의 공동합의문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결국 수도권 매립지의 현안문제를 다루기 위한 서울시의 미봉책이다.
즉 서울시는 201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종료시한을 앞두고, 인천시를 달랠 필요를 느끼고 있던 터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시한인 2016년이 다가오는 시기에 서울시는 새로운 매립지를 구상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연장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대체 매립지를 구상하려고 해도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보다 더 좋은 조건의 매립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지금의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의 합의책이 아닌 경인아라뱃길 보상금 전액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한다는 당근책을 내어 놓은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에 따른 인천시민들의 고통을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대체 매립지를 물색하기 보다는 편한 방법으로 수도권 매립지의 연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는 2011년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명분으로 태스크포스를 활성화한다는데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이후 그 태스크포스가 활성화되어 운영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이번의 당근책으로 내어 놓은 보상책이 경인아라뱃길의 보상금이라는데 있다. 경인아라뱃길의 보상금이 수도권매립지의 환경개선사업에 쓰인다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태스크포스는 가동된 바 없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사이에 나온 이번 합의는 분명 당근책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에 인식을 같이 한다’는 조항을 내어 놓았다. 현안의 해결이라는 문제는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매립지의 연장문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단순매립이 아닌 소각 매립을 의미한다. 두 지자체간의 동상이몽을 뭉뚱그려 놓은 조항이다.
다만 인천시와 서울시가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해나가기로 한다는 점에서 두 지자체간의 이해는 일치한다. 결국 서울시의 ‘현안해결’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가지고 앞으로 두 지자체 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지자체 간의 매립지 현안문제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실제로 매립지 주변의 시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보상할 것인가 하는 점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당근책을 가지고 주민들의 고통을 단순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경인아라뱃길의 토지보상금 전액을 내어 놓는 획기적인 당근책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리고 이 당근책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강제집행력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이 토지 보상금은 서울시가 보관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천시민들의 돈이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어나가겠다는 의지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의 연장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으로 역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입장이다.
향후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서울시도 인천시에 수도권 매립지 운영주체로서 그 지분을 인정해주는 파격적인 해결책을 내어 놓지 않는한, 쉽사리 이 문제가 결론이 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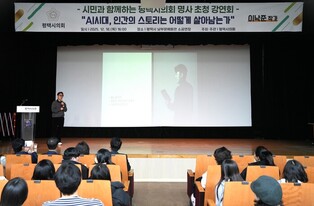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