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불장군 기질…못 말린다니까 쯧쯧…”
고정관은 혀를 차며 엉거주춤 서 있다가 이를 악물고 뒤따르기 시작했다. 눈 깜짝하는 사이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30m 정상까지의 등반을 끝냈다.
“아. 끝없이 넓은 푸른 바다. 어족들이 부럽구나! 약육강식은 있어도, 빈-부의 차 없고 계급투쟁도 없는 어족공화국-정말 부럽다니까. 부르주아들이 바다를 배워야 할 터인데!”
“자리돔 잡아먹기도 두렵네요, 약육강식이라서…”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청승떠는 넋두리를 했다.
그리곤 눈을 크게 뜨며 시야를 넓혔다. 범섬(虎島)과 가파도-마라도가 돋보인다. 두팔을 쭉 뻗으면 세불곶 포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플랑크톤같이 느껴졌다.
잠시후 그들은 고개를 들며 정신을 차리고 마라도 쪽으로 기울였던 시선을 거두었다. 그때였다. 두 사람은 몸을 떨며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니, 저건 해적선…? 유혈이 낭자하고 살인극이 벌어졌잖아? 저쪽을 보게! 1백여m 너머의 언덕 밑에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사건이…”
“음, 복면을 했군, 5명의 괴한들, 좀 전에 우리를 먼발치로 미행했던 그 치들 틀림없네요”
“어선을 훔쳐 타고 달아나려다 붙잡혔나보군! 누구일까? 한남마을을 탈출하려다 덜미잡혀 개죽음 단한 장본인은…?”
“자, 형님 빨리 뛰어가서 확인을 해보자구요”
“음, 그래야겠어”
두 사람은 나는 듯이 세불바위에서 내려왔다. 가파른 기슭을 허겁지겁 돌고 돌아 잠시후 사건현장 근처에 당도했다. 벌써 그곳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시끌벅적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두 사람은 군침 흘리며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다. 관중들의 시선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아니, 저 사람은 한남마을 고정관씨 아닌가? 일본전국에서 웅변의 일인자로 명성을 떨쳤던…. 해방된 조국 땅에서 크게 한 몫 해야겠지!”
“음, 일본 군대에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금환향하는 셈이군!”
“그리고 저 사람은 조용석-경성에서 대학을 다니다 학병으로 나갔다던데, 역시 금의환향을 했군!”
“조용석, 저 사람은 조선 땅에서 웅변왕 자리를 독차지 해 왔다니까 정계로 진출해서 한 몫 할 걸 아마!”
이쪽 저쪽에서 침이 마르도록 감탄하며 쑥덕거리는 소리가 귀따갑게 들려왔다. 구 사람은 민망하고 쑥스럽기도 했지만, 어깨를 으쓱거리며 몇발짝 앞으로 나아가 사건 현장으로 바싹 다가 있다.
순간, 이빨이 달달달 떨리고 간덩이가 콩알만큼 오므라들고 있음을 느꼈다.
2구(具)의 사체-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깡마른 남자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호리호리한 여자인데, 두 사람 모두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 붉은 피를 흠뻑 뒤집어 쓴 채 알몸으로 모래톱에 나동그라져 있다.
남자는 머리를 남쪽으로 바다를 향해 네활개를 펴서 우악살스럽게 뻐드러졌고, 여자는 한라산 쪽을 향해 하늘을 우러러 오동포동한 가슴패기와 펑퍼짐한 아랫도리를 그림 전시(展示)하듯 드러내고, 네활개 쫙 편채 흉물스런 몰골로 나자빠져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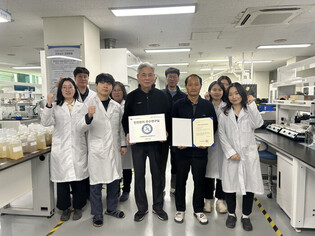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치매관리사업 ‘경남도지사 표창’](/news/data/20251222/p1160278600517158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