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올해 동 신년인사회를 다니는 내내 구로구 일반계 고등학교의 명문대 합격자 수가 구민들의 주된 관심거리였다.
정시 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2월 초 현재 그 수치가 지난해에 비해 3배나 늘었기 때문이다.
많은 주민들은 “구청이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더니 결실이 나오고 있다”며 나에게 인사를 했다.
실제로 구로구청장이 된 후 나는 교육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2011년부터 구로고, 오류고를 리딩스쿨로 선정해 4년간 매년 2억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과학중점학교인 신도림고에도 4년간 매년 1억원씩 지원하고 있다. 학교별 우수프로그램, 구로연합 영수교실, 논구술 프로그램, 원어민 보조교사, 구로연합 영재아카데미, 생명공학 인턴십 프로그램, 수시대비 맞춤식 준비 프로그램, 진학 및 취업지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력신장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시설과 학습환경 개선사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치구 첫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관내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점차적으로 25명 이하로 줄어들게 되고, 원하는 선생님들에게는 보조교사도 배치된다.
나는 이런 노력의 결실이 해가 갈수록 더욱 풍성하게 맺어지리라 확신한다.
그런데 수월성교육, 경쟁교육을 반대하는 내가 이렇게 다양한 교육지원책을 펼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구로구민들이 교육분야에 대한 변화를 강하게 바라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최한 구민 500명 원탁토론회에서 구민들은 ‘구로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 질문에 교육분야 개선을 으뜸으로 뽑았다.
둘째는 더 이상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주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구로구청장이 된 후 구민들이 교육 때문에 이사하는 현실은 매우 크게 다가왔다. 많은 주민들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구로구를 떠났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 구로구를 또 떠났다. 내가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와 그 입학생들이 6년 후 졸업할 때의 숫자를 비교해보니 70명이 줄어들었다. 한 반을 35명 정도로 볼 때 두 반이나 사라진 셈이다.
‘구로에 있으면 좋은 대학 가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주민들로 하여금 구로구를 떠나게 했고, 남은 학생들은 또다시 뒤쳐지는 ‘교육의 악순환’이 일어났다.
문제는 교육으로 인한 이사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떠나려하는 곳에서는 어떤 자치정책도 소용없기 때문이다.
‘교육 이사(敎育 移徙)’의 현실은 비단 구로구만의 얘기는 아니다. 서울시 많은 자치구 주민들이 교육 때문에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수많은 국민들이 교육 때문에 사는 곳을 떠난다.
이제 정부가 나서주기를 간곡히 건의 드린다. ‘교육 이사’의 문제는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는 힘들다. 교육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떠나는 주민들은 늘어나고 지방자치의 의미도 퇴색해 갈 것이다.
다들 교육 때문에 이사 가지만 아직 이 문제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적은 없다. 하지만 ‘교육’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인식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에는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얻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해야 한다.
교육으로 인한 이사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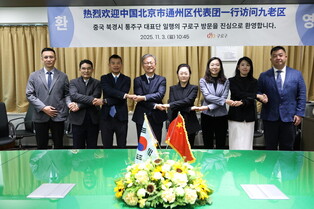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1인가구 지원사업 선도모델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4/p1160279219128288_34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민선8기 2주년 구정 성과공유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3/p1160278441427235_442_h2.jpg)
![[로컬거버넌스]일자리·여가가 있는 활력 노후생활··· 마을마다 소외없는 돌봄· 안전망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2/p1160272400425295_86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고터·세빛 관광특구’ 글로벌 명소화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030/p1160278334289070_52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