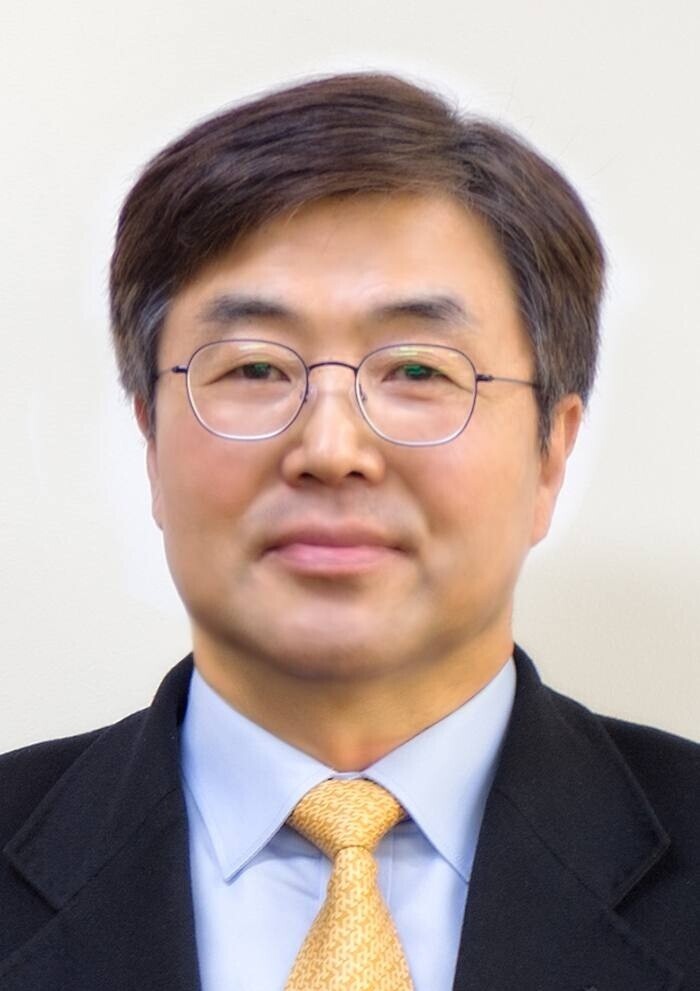 |
서로가 뻔한 이웃끼리 없는 역사도 만들어 내는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이다. 치밀한 동북공정이나 빈번한 역사 왜곡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릇된 사실도 만들고 끼워 넣기에 바쁜 그들이다. 반면 ‘있는 역사’도 ‘없다’하고 ‘현존하는 사실’조차도 ‘아니다’라고 부정하며 댓살 깍듯이 훑어내리기 일수인 나라, 편 가르기에 이골이 난 나라가 있다. 바로 한국이다. 우리는 어째서 이래야만 하는가.
가을을 재촉하는 가랑비가 추적이던 지난주 15일,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에서 거행된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1906~1965) 선생의 58주기 추도식은 소박하면서도 엄숙했다. 한민족이 낳은 음악의 거장(巨匠), 세계적 지휘자로 국민적 자긍심을 한몸에 받을 유족이건만 참배객은 물론 지난 몇 년의 광풍(狂風)에 세상을 등진 듯 말수가 극도로 적었다.
실로 유족이 겪었을 ‘문재인 사람들’의 역사 전쟁은 집요했다. 아닌 사실도 치고 빠지기와 반복적 효과로 감성적 포퓰리즘을 이끌었다. 공정해야 할 ‘적패청산론’은 ‘인간의 내면적 성찰도 없이 집단적(팬텀정치) 카타르시스의 광기로 흘러 넘쳤다. ’파괴의 철학‘을 앞세운 모택동식 한국정치판의 조반유리(造反有理)가 따로 없다.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없다(不破不立)는 지독한 ‘파괴의 욕구’. 이는 좌파 진보진영을 관통하는 지배올로기의 하나다. 구질서 구체제에 대한 비판과 부정(否定)에는 빼앗긴 나라의 지식인과 선각자들이 갖는 고뇌와 번민은 한갓 기득권만 누리는 나약한 기회주의자들로 전락했다. '문재인표'‘건국 100년’ 역사전쟁은 ‘친일인명사전(2009년 발간)’이란 이들의 ‘성전’ 앞에 여지없이 무릎 꿇렸다.
친일 적패청산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의 천둥 같은 울림으로 겨레의 혼을 일깨운 위암(韋庵) 장지연 선생도 피할 수 없었다. 일제의 무단통치와 문화통치, 민족문화말살통치에 갖은 피박과 고난의 질곡을 헤쳐 왔거늘, 동족에 의한 단죄의 칼을 또다시 받는 비통함이야 어찌 말로 다 형언할 수 있으랴.
위암만이 아니다. 만주국 창설 기념음악회의 지휘대에 섰던 안익태, 조선학도병 격려 포스터에 삽화 몇 점 그려준 운보 김기창, 친일잡지에 ‘이토(異土)’라는 시 한 편을 쓴 정지용, 그리고 춘원·청마·미당·난파 지독히도 불행했던 시대의 슬픈 지식인들은 친일파라는 낙인이 찍힌 채 지하에 누운 일군 (一群)의 군상에 불과했다.
‘내가 옳다’는 적패청산의 양심, 정의의 사도를 자청한 그들은 과연 그 모진 세월을 단 하루도 살아낸 적이 있는가. 정지용의 고백처럼 ‘친일도 배일(排日)도 못한’ 식민지 백성의 고달팠던 삶을 인격의 전부, 생애의 전체를 통해 바라보지 않고 단편적인 행적 몇 개로 토막토막 끊어내 침을 뱉을 만큼 고결한 정의감이, 그토록 당당한 도덕적 자신감을 내세울 자가 있는가. 오늘을 사는 자유대한에서도 쉽지 않은 주문이다.
땅도, 이름도 빼앗기고 성마저 갈아야 했던 숱한 민초(民草)들은 고난 자체가 삶이었다. 엄숙한 민족정기를 어떻게라도 뿜어낼 수는 없을까. "음악은 국제적인 언어이며 나라의 경계를 넘어 인간을 하나로 뭉치게 한다." 애국가의 배경이된 안익태 선생의 말이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교향악단을 움직인 지휘자이자 우리 가락을 유럽과 미국에 알린 음악인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글로벌 시대를 앞서간 월드스타이며 평화론자인 셈이다.
여론을 등에 업은 ‘친일 적폐 청산’ 작업은 소위 친일 작곡가 9인(김동진·김성태·김재훈·안익태·이종태·이흥렬·조두남·현제명·홍난파)이 작곡한 노래가 대상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애국가를 폐기하고 새 국가를 제정하는 것이었다.
부조리한 친일 적패몰이의 역사적 판명은 애당초 끝이 났다. 애국가는 이미 그 자체로 민족의 얼과 혼이 됐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됐다. “누군가 조선 해안이 보인다고 소리쳤다. 누구의 지휘라 말할 것도 없이 애국가가 합창으로 흘러나왔다. 애국가는 끝까지 부르지 못하고 울음으로 끝을 흐렸다.”(장준하 <돌베개>). 1945년 11월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 비행기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뿐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 말고는 세계 1위를 할 일이 없던 시절, 시상대의 선수는 물론 중계하는 아나운서까지 목이 메고 온 국민이 흐느끼며 하나되게 만든 노래가 애국가였다. 5·18 광주에서 계엄군과 맞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부른 노래 역시 애국가와 아리랑이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애국가를 다른 노래로 대체한단 말인가. 미우나 고우나 애국가는 우리 국가의 고결한 상징이요 표상인 것을.
안익태, 그리고 정율성과 윤이상. 음악예술의 가치철학부터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차이를 두고 있다. 세계적인 음악가 이전에 대한민국 애국가에 곡을 짓고 코리아판타지를 통해 동양평화, 세계평화를 노래한 안익태 선생이다. 6.25 항미원조(抗美援朝)를 앞세워 민족과 강토를 유린한 중공‘팔로군 행진곡’,북한의 군가인 ‘조선 인민군 행진곡’ 등 전쟁의 호전성을 가슴에 꼿아넣은 정율성이지 않는가.
다름이 있다면, 애국가를 안긴 평화주의자을 기릴 번듯한 기념관 하나, 변변한 콩쿠르 하나 헌사 치 못한 우리의 처신이다. 동족에 총칼을 겨눈 침략자를 기리는 기념관엔 쓸 국민 세금은 있어도 이런 외면이 지구상 또 어디에 있나 기가 찰 일이다. 윤이상 음악제를 하는 지역도 있고, 김원봉이 단장이었던 의열단 공원도 있다. 이러고도 ‘나라’라고 외칠 수 있나.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무엇이 적폐인가. 이래도 ‘이념몰이, 색깔론, 메카시즘’ 이라고 말할텐가, 이제 정말 따져볼 일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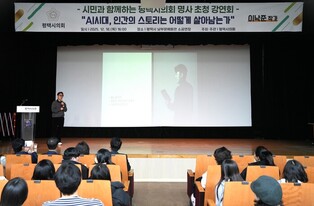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