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얼마 전에 미국 연방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조 맨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정책 목표였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에 끈질기게 반대하면서 미 행정부 정책을 가로막는 캐스팅보트를 휘두르며 끝내 IRA가 당초 BBB보다 훨씬 축소된 형태로 통과되게 만들었다. 특히 그가 강조한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조금 조항을 법안에 넣어 한국 자동차 기업과 정부를 뒤흔들기도 했다.
원래 미국은 상원의원 전체 100석 중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50대50 사이를 팽팽하게 오가며 한두 석의 차이를 내는 한편 하원의원도 전체 435석 가운데 양당 가운데 한 쪽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도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당 소속 의원들이 특정한 당론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의원들 각자가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게다가 맨친 의원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중도우파 성향인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애리조나)이 민주당을 탈당한 데다 향후 친민주당적 입장마저 거부해 의원 누구라도 튀기 시작하면 정말 통제하기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상원에 대한 안정된 과반이 약화돼 개별 의원들의 지지에 더욱 신경쓰고 매달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양당 정치의 구조 아래 있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과 115석의 국민의힘이 전체 300석 중에서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정당 이래야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각각 1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언론과 국민들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 국민의힘을 ‘여당’이라 하고,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며 정권을 잃은 민주당을 ‘야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호칭은 일본에서 사용한 것을 인용하면서 일반화 했다.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대통령 또는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붙여졌고, 야당은 권력에서 밀려나 들판에 서 있는 처지와 다를 바 없다고 하여 그리 부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민주주의 권력 체제의 시각에서 보면 이 용어 자체의 사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3권 분립은 존 로크와 몽테스키외를 거쳐 이론이 정립되면서 전 세계 거의 대다수 국가들이 이에 따른 권력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 핵심적인 정치적 논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대통령이 (더러는 군주가) 막강한 힘을 가진 채 행정부를 움직이는 상황에서 국회는 입법부로서 법률 제·개정권, 예산 편성·심의·결정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한 고위직 임명 동의·인준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대통령을 견제해서 국가 권력의 균형을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는 이러한 측면의 정치적 현실화가 시급하다. 여당은 대통령의 강력한 장악력에 따라 움직여지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정한 방침에 따라 당론이라는 이름 아래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향후에는 국민의힘을 집권당이라 부르고, 민주당은 그저 정당 이름을 사용하면 될 일이다. 미국과 유럽의 정당을 거론할 때 여당·야당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잖는가. 사실 미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중에서 최소한 51% 이상은 의원들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한다.
워낙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가진 권한이 막강해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양당은 너무 지나치게 여당은 여당적이고, 야당은 야당적이다. 여당 의원은 정부의 정책과 입장에 거의 끌려가는 경향이 강하고, 야당 의원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흐름이 일상적이다. 특히 이번 민주당은 20대 대선 이후 이른바 ‘허니문 기간’조차 무시한 채 전방위적인 공세 속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거의 모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지킬 때 만큼은 여·야가 합심한다고 해서 따가운 비판의 시선을 받는 정도다.
한국 국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국민이 주목하고 믿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한다. 대선후보 또는 중진이 되고 나면 국회를 무시할 정도로 소홀히 하는 방식이라서는 안 된다. 입바른 소리를 외쳐댄다며 언론을 타려는 유치한 정치인을 말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주요 정당별로 5~10명 정도, 아니 그 보다 다소 적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입장을 같이 하며 국회 운영을 통해 법률과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우리 모두의 나라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당이 돌아가게 되는 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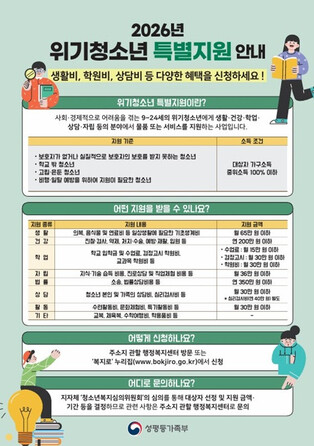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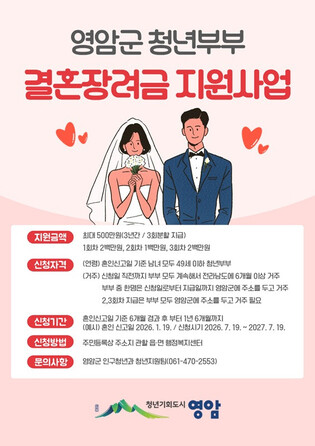

































![[로컬거버넌스]인프라 혁신으로 '체육르네상스' 연다… 인구 유입 늘고 지역상권에 활기](/news/data/20260111/p1160275997812534_36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