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열기가 뜨겁다. 여러 가지 쟁점이 나타나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특히 당헌·당규를 고쳐 당 대표 선출에서 당원 100% 투표로 결정하도록 만들면서 당원 숫자를 놓고 오가는 말이 많다. 책임당원이 무려 89만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면서 이른바 100만 당원의 표심을 놓고 온갖 셈법이 출몰하고 있다.
당원이 당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는 방식이 원칙에서는 맞다. 선진 민주국가들 중에 한국 보다 당원 수가 많은 나라는 미국 뿐일 정도로 당원 숫자가 많고 국민 대표성도 높다. 미국은 전체 인구가 3억4000만명 수준인 가운데 당원 수에서 공화당이 3300만여명, 민주당이 4400만여명이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소속 정당이 미국민 대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체성과 소속감이 확실해 서로 다른 정당과 공직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할 정도이다. 이러한 정치 풍토를 가진 미국의 경우 공직후보자 선출에서 대의원이 선출하는 코커스 및 일반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프라이머리 방식이 있다. 물론 기본은 당원에 의한 선출이다. 그 방식에서 대의원이 선출하는 방식인 코커스와 당원이 선출하는 방식인 클로즈드 프라이머리가 있다. 그 밖에 국민 중에 투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비중이 5%에 못미치는 가운데 투표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자민당의 당원이 100만명을 갓 넘는다. 지역구별로 후보를 선출하되,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하원의 중의원 및 상원의 참의원 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공천 주도는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훨씬 넘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채 지배하는 가운데 7대 파벌이 협의하며 공천을 진행해 파벌 막후 정치와 소수 밀실 공천으로 비판받고 있다.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양당 구조 하에서 경합하고 있다. 그 중에서 더 많은 총리가 집권하며 더 오래 집권한 보수당의 경우 지난 2019년 7월 총리 선출 과정에서 보수당 당원 16만명이 총리를 선출했는데, 영국민 6750만여명 가운데 0.23%에 불과한 극소수 집단이 선출하는 구조여서 대표성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특히 영국 출신의 백인이 97%이고, 중산층 이상이 97%를 차지하며, 남성이 71%인 데다 65세 이상이 44%로 평균 57세여서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2022.7월 총리 선출에서도 이들 등록 당원들이 우편투표로 당대표를 선출해 총리로 임명하면서 다시 거론된 바가 있다. 10월 리시 수낵 총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선거를 주관하는 평의원 모임인 ‘1922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하기도 했다.
독일도 소수 정당들이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골격은 양당제다. 특히 중도우파 정당으로 직전까지 집권한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CDU)의 경우 당원이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으로 구성되어 40만명대 정도인데, 전당대회를 열어 당수를 선출하면 의원내각제 국가의 관행에 따라 총리를 맡아 내각을 구성해 독일을 이끌어왔다. 지난 2021년 집권한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사민당·SPD) 역시 당원이 40만명대 정도로 영국의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오래 동안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도자도 겸하면서 노동자 집단을 근간으로 삼아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한편 중산층 및 서민들과의 연대를 확대함으로서 존립하고 있다.
프랑스는 집권당이라고 해야 당원이 형편없이 적은 숫자로 추정된다. 사회당의 몰락 속에 전통적인 양당제가 무너진 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하며 급하게 창당한 ‘전진!(앙 마르슈!, 약칭 LREM·LaREM)’이 집권당이 된 뒤 2017~22년까지 ‘전진하는 공화국!(라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을 거쳐 지난해 마크롱이 재선되자 총선을 앞두고 5월 5일 다시 ‘부흥(르네상스)’으로, 5월 10일 ‘대선 과반을 위해 함께(앙상블)’로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어 정당 기반조차 취약한 실정이다.
이탈리아도 양당제가 무너진 후 정당들의 당원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 가운데 특정인과 그 지지 세력이 창당해 이끌어가는 신생 정당들이 난립하며 권력을 주고받는 실정이다. 포퓰리즘 성향으로 무장한 채 직전에 집권까지 했던 ‘오성운동’이 당원 수가 10만명 정도이고, 오성운동과 연립 정권의 한 축이었던 극우 성향의 ‘동맹’이 15만명 정도였다. 현재 연정을 주도하는 극우 성향의 집권당인 ‘이탈리아의형제들’이 13만명 정도이고, 연립 정권의 한 축인 중도우파 성향의 ‘전진하는이탈리아’가 10만명 정도인데, 국력과 잠재력 자체의 퇴조 속에 정당들마저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원 숫자로 볼 때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각각 300만명이 넘는다. 진성 당원도 100만 당원을 헤아려 당원만의 투표로 당대표를 뽑아도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도 아닌,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어서 책임당원이 선출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친윤과 비윤으로 갈린 채 특정인 또는 일정 세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세우기 위해 여론조사가 높은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 당원 100% 투표로 바꾸는 한편 또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결선투표제까지 집어넣어 비판을 받는 것이다.
어쨌든 이젠 선거전이 한창인 상황에서 당원이 현명한 집단지혜를 발휘해 줄 것만 믿을 수 밖에 없다. 책임당원 숫자가 많아 원내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원들의 표심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통합과 연대의 정치력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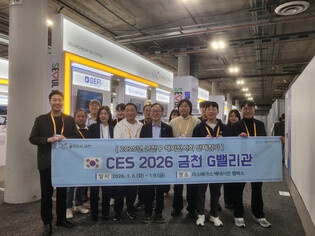






































![[로컬거버넌스]인프라 혁신으로 '체육르네상스' 연다… 인구 유입 늘고 지역상권에 활기](/news/data/20260111/p1160275997812534_36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