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람에 대해 세금을 물리게 한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세법 7조2항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채 행정당국이 자의적인 조세 부과를 할 수 있게 한 지방세법 7조2항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7조 2항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납세 의무자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한다. 민법이나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선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땅 733.7㎡(약 222평)를 14억6500여만원에 분양받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448만원가량(원금의 0.3%)을 제외하고 땅값 대부분을 냈다.
A씨는 잔금 미납으로 토지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4년을 보낸 뒤 2018년 다른 사람에게 땅 분양권을 14억5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관할 구청은 지방세법에 따라 A씨가 이 땅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었다고 보고 토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91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자신이 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 취득세가 부과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원고 패소로 판결하자 A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안을 심리한 헌재는 "등기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취득세 납부 시기를 무한정 늦추거나 전매(되팔기)해 취득세를 면탈하는 등 납세 의무를 잠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례 가운데도 A씨처럼 사회통념상 대금이 거의 다 지급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행정당국이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우러 헌재는 '지방세법에는 '취득'이 무엇인지 정의 규정조차 없다'는 주장에 대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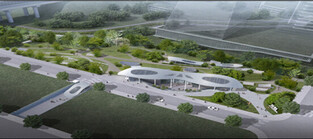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news/data/20251230/p1160278487779617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연말 겨울여행 명소 추천](/news/data/20251228/p1160273383015143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혁신군정' 성과](/news/data/20251225/p1160285318798120_814_h2.jpg)
![[로컬거버넌스]인천관광공사, 연말연시 인천 겨울 명소 추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news/data/20251224/p1160266097659898_2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