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문성 서정대 교수 |
대화에 있어서 의미를 전달하는데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심리학자 앨버트 메러비안은 비언어적 표현방법인 표정과 태도가 55%, 음성과 억양이 38%, 언어는 고작 7% 정도 차지한다고 했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앨버트 메러비안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불안감 정도에 그 의미가 좌우될 수 있고, 주변의 환경 및 장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SNS를 통해 문자나 동영상으로 떠돌아다니게 되면 말을 내뱉는 순간의 맥락이 고려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언어적 표현방법을 대화수단으로 활용함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침묵’이다.
힘을 가진 자가 침묵하면 사람들은 불편해지기 마련이다. 사람이란 해석과 설명을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 숱한 정치 풍자 유튜브 방송의 놀라운 조회 수가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말을 삼가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중요하고 힘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며, 무엇보다 그 자신이 후회하거나 리스크가 큰 실언의 순간도 줄일 수 있다.
누군가가 성가시게 굴거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상처를 주며 괴롭힐 때도 침묵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 때의 침묵은 ‘경멸’과 ‘무시’라는 시그널의 의미를 갖는다.
‘말’을 통해 대응하게 되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의 위상을 오히려 강화시켜 줄 수 있으며 오히려 ‘말’을 하는 사람이 보잘것없어 보이게도 된다. 그보다는 등을 돌리고 경멸감과 모독을 줄 필요가 있다. 그들이 없어도 이 세상 편하게 잘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만 보여주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일일이 대처하면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문제를 인정한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문제를 침묵으로써 대응하는 방법이 타당할 수는 없다. 암덩어리로 번질 수 있는 문제와 무시하면 알아서 사라질 사소한 염증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때 아닌 식민사관이 논란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인터뷰를 통해 ‘SNS로 덕을 본 정치인은 나 하나다.’라고 하며 불필요한 발언과 의미가 모호한 사진의 인스타그램 공유에 경고를 준 적이 있다.
정치인은 상대방의 발언을 ‘언제나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정치인이면 말이 아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설득력을 얻어야 한다. 이제는 침묵이라는 비언어적 정치 표현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고, 발언이 가지는 파급효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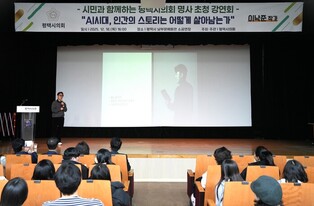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