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정책상품은 문제 있는 독과점이다. 정부 이외의 다른 생산자는 상상할 수 없고, 애프터서비스도 막다른 길에 몰려야만 해 주는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소비자인 국민들이 정부의 생산품을 선택의 여지없이 받아들이면서도 내심 불안감을 느낀다면, 독과점업자로서의 무한책임을 느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수돗물바이러스 논쟁도 그렇다. 97년 민간에서 처음으로 수돗물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5월까지 4년여 동안 바이러스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었다.
국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정부의 공식발표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환경부가 정수장과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전문가들의 각양각색의 의견이다. 검출 바이러스의 양을 놓고 괜찮다·위험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검출방법을 믿을 수 있다·없다로 공방을 계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는 전문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사람의 본능적인 방어자세일 것이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수돗물 바이러스의 위해성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정수장 처리기준 도입·노후상수관 교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내 놓고, 일단 믿어달라는 입장이었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에 대해서는 ‘경보 발령’을 내리겠다고도 발표했다.
생산자의 애프터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빠져있다. 그 전제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검증이다.
대도시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생산자인 정부의 기본적인 책임이다. 신뢰를 주는 진단을 내 놓지 못하는 마당에, 처방에 대해 믿음을 가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국가경영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신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이 정부정책을 믿지 않으면, 그 때마다 각종 증거를 첨부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생산자인 정부가 소비자인 국민의 상품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신뢰는 강요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꾸준히 정성껏 쌓아가야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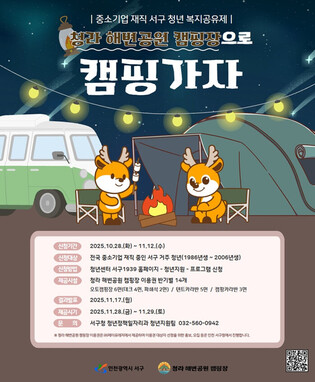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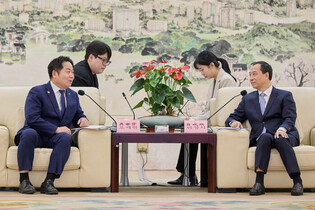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주거정책 포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6/p1160278518713968_66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농업 체질 개선 전방위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5/p1160278371910081_82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1인가구 지원사업 선도모델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4/p1160279219128288_34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민선8기 2주년 구정 성과공유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3/p1160278441427235_44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