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원장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문건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언론의 보도 내용이 무엇이고 보도의 사실 여부, 교육부 대책 등을 메모한 수준으로 이를 ‘비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의 주된 대상이다.
더구나 문건 제공 건 외에 김 전 원장 개인 비리에 대해서까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 비밀누설 자체보다는 다른 구실로 당사자를 형사처벌해 ‘비밀누설자’에 대해 본때를 보여주려는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알렸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또 ‘공무상 기밀은 누설에 의해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게 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1996년 5월 10일)를 통해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비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밀누설죄로 기소되는 경우라도 법원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가지각색이다.
특히 비밀누설은 늘 국민의 알 권리 및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측면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슈화될 때마다 사회적 논쟁거리가 된다.
비밀누설을 했지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부패방지위원회에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 관련 사안을 고발했을 때에만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지문 내부고발자센터 소장은 “고발 주체를 반드시 공직자로 한정하지 말고 부패와 관련이 없더라도 내부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며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 객관적인 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86년 내부고발자보호법을 만들어 시행 중인 미국은 부패뿐만 아니라 정책 실패, 예산 낭비, 국민건강과 안전의 침해 등 공익적 가치에 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부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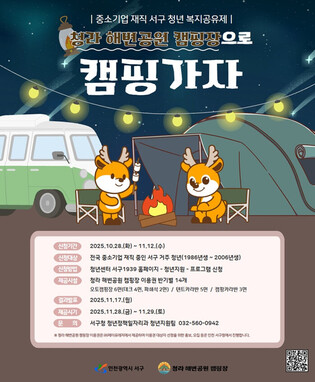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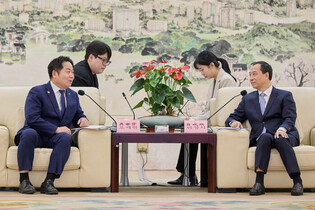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주거정책 포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6/p1160278518713968_66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농업 체질 개선 전방위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5/p1160278371910081_82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1인가구 지원사업 선도모델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4/p1160279219128288_34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민선8기 2주년 구정 성과공유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3/p1160278441427235_44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