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봉우리를 굴대 삼아 빙글빙글 돌고 있는 회전목마처럼, 버스는 휘우듬한 일주(一周)도로 위를 숨가쁘게 달리고 있다. 마치 먼 이국 땅의 명승지를 배경으로 찍은, 장대한 스펙터클 영화의 장면 같다. 그러나 버스만을 따로 조명했을 때의 얘기는 다르다. 우툴두툴 가파른 길바닥에 훅훅 짙은 매연 내뿜으며 죽을둥 살둥 뭉그적거리고 있는 ‘초만원 고물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값한답시고 ‘고물’을 관록으로 착각한 나머지, 버스는 고압적인 자세로 승객 위에 군림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밉든 곱든 ‘대중교통수단’인 것을 어쩌겠는가.
1945년 9월15일. 그날 13시에 제주차부를 떠나 서쪽 해안선을 굽이돌고 달려온 버스는, 서귀포 못미처 ‘도선 마을’ 정류장에 뜨르륵 멈췄다. 고정관(高正寬)과 조용석(趙容奭)이 비틀거리며 버스에서 내렸다.
“이건 고향길이 아니고 고생길이군! 10년 감수했네’ 정류장 근처에서 여행가방 내려놓고 작업복 앞섶의 먼지를 툭툭 털며 고정관이 떫은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다, 이유가 있지요. 사내자식 뜻을 세웠으면 출세해서 금의환향할 일이지 꾀죄죄한 꼬락서니가 뭐냐하고 벌을 준 것 아니겠어요?”
비꼬는 목소리로 조용석이 맞장구를 쳤다.
“그래, 잘 났어. 작업복차림이 어째서 죄가 된다는 얘긴가? 검소한 금의환향인데…”
“시골사람들의 수준이 어디 형님 수준과 같아요?”
두 사람은 곧 ‘한남(韓男)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도선 마을에서 한남마을까지의 거리는 약 1㎞-남쪽 길로 들어서니 300m쯤 걸어가자 꿈에 그리던 정든 고향 한남마을 한쪽 모서리가 빼주룩이 시야로 들어왔다. 순간, 두 사람의 눈에 어머니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다.
벌겋다 못해 까맣게 그을린 주름투성이 얼굴 40대 중반인데도 50대 후반인양 폭삭 겉늙어 볼장다본 할망구 모습이 아닌가.
한평생 해녀생활하면서, 과부의 몸으로 아들의 학비와 하숙비를 대주며 뒷바라지하느라 말로는 즐겁다지만, 몸으로 때우는 그 고생 그 비애 무엇에 비길 것인가? 두 사람은 한참동안 고개 숙여 눈물을 떨어뜨리다 코를 훌쩍거린 다음, 고개를 들어올렸다.
“어이, 우리 저 소나무 밭에서 휴식취하다 일몰 후에 들어가자구. 눈물 때문에 낮에 들어가기가 그렇잖아? 지금 16시니까 얘기도 좀 나누고…”
“네, 좋아요. 실컷 낮잠도 자고, 밤에 들어가요!”
두 사람은 소나무 그늘에 여행가방을 베개삼아 드러눕기 바쁘게, 코를 드르렁거리며 깊은 잠에 빠졌다.
고정관과 조용석 두 사람은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탓인지, 대학에서 서클활동을 통해 공산주의에 입문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골수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오나 노동자와 농·어민의 우상으로 인정을 받았다. 뿐더러 일국의 ‘웅변왕' 자리를 굳힌 ‘개천의 용’이자 ‘인간확성기’로서 명성을 떨쳤다.
그런데 두 사람은 외편으로 끈끈하게 정이 든 사촌뻘 ‘괸당’이지만, 그 보다는 정치적 동아리로서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기로 하늘에 맹약한 바 있는 열혈동지(熱血同志)사이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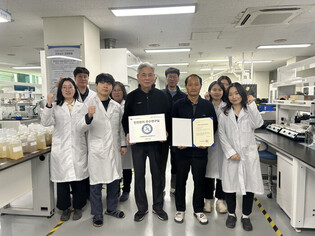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치매관리사업 ‘경남도지사 표창’](/news/data/20251222/p1160278600517158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