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그날 밤…’을 힘주어 강조하는 데엔 필시 숨은 곡절이 있었나 본데. 도대체 그게 무엇이란 말인가? 이만성으로 하여금 아얏소리 못하도록 급소를 찌를 수 있는 비장의 무기, 그것을 움켜쥐고 있음을 뜻하는 협박성 말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만성은 느긋하니 우회작전을 쓰기로 했다.
“우선 오빠에 관한 얘기부터 들어야겠어. 종선군은 7년동안 줄곧 고향에 머물러 있었던게야?”
“모르고 계셨군요. 저의 오빠는 이 세상에 없어요. 죽었다구요. 지난봄 어선을 타고 고기잡으러 나갔다가…. 시신도 못 찾구…”
그녀는 울먹거렸다.
“그렇게 되었어? 고기잡이 나갔다가…? 내겐 둘도 없는 막역한 친구였는데, 하늘도 무심하구나!”
이만성도 울먹거렸다.
“오빠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 피살된게 틀림없다구요”
“뭐야?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 피살…? 누구야 그게? 범인을 알고 있다면 말해봐! 뭘 꾸물거려? 어서…”
“이만성씨가 잡아주시는거죠? 약속해 주세요. 범인을 때려죽여야 한단 말예요, 제 손으로…”
김영선은 울음을 터뜨리며 이만성의 손을 덥석 붙잡고는 부리나케 졸라댔다.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로 얘길해 보라니까. 범인의 정체를 알아야 죽이든지 살리든지 손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
“말씀 드릴게요. 한남2리 천외동에 사는 도청서기 최상수라고 있잖아요? 그자라구요. 그자는 천하의 바람둥이 팔난봉으로 이름이나 있거든요. 도선마을 방준태와 붙어 다니면서 얼굴이 반반한 젊은 해녀들을 수없이 망가뜨렸지 뭐예요. 그자는 저에게도 추파를 던졌던 거예요. 오빠가 손을 봐주지 않았더라면 저도 무사할 수 없었을 걸요. 그래서 그자는 오빠에게 원한을 품어오다 오빠를 바다로 꾀어내 술을 먹이고 배가 풍랑으로 뒤집힌 것처럼 조작해서 오빠를…”
그녀는 격하게 몸을 떨며 말끝을 맺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음, 그랬었구나! 동생을 보호한 죄밖에 없는데, 그런식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다니…. 걱정 할 것 없어. 내게 맡기라구, 최상수 그치는 우리집안의 원수이기도해. 일제 앞잡이 노릇하며 우리땅 노른자 몽땅 갉아먹은 날강도 같은 놈들이야. 절대로 용서못해”
주먹을 불끈쥐며 이만성이 으드득 이를 갈았다.
“알았어요 오빠! 오빠만 믿겠어요. 아버지가 그 당시는 보잘 것 없는 어부신세였으니까 손을 쓸 수가 없었지 뭐예요. 지금 정도만 되었어도 그치들 가까이 오지도 못 했을 텐데…. 그런데, 그치는 해방되기 바쁘게 부산쪽으로 내뺐다는 소문이 들리던걸요”
“부산이 아니고 제주성내에 숨어있어,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게야. 두고 보라구, 그토록 선량한 내 친구 종선이가 그놈의 손에 죽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야. 죽었다니 더욱 생각나는군! 7년전 일이었어. 영재의숙에서 방과후 종선이가 나더러 집에 가서 자고 가라고 해서, 하룻밤 신세를 졌었지. 정말 고마웠어”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날 하루종일 폭우가 쏟아져서 다리없는 ‘악근천’을 건널 수 없게 되자, 귀가할 수 없는 만성씨를 우리 오빠가 딱하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 남매의 자취방으로 가자고 했던 것 아니예요? 한남마을에 친척집도 있었지만, 만성씨는 우리 집을 택한 거라구요. 그 바람에 이만성씨와 저는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는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던 셈이죠”
“그 바람에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이 비좁은 자취방 한 이불 속에서 나란히 누워 잠잤던 일 기억하고 계시죠?”
“음. 그랬던 것 같군”
“제가 맨 아랫목에 누웠고, 그 다음은 우리 오빠가 그리고 바깥쪽에 만성씨는 누웠었잖아요? 우리 오빠는 잠자리에 들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지만, 저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거든요. 왠지 아세요?
“내가 불편을 끼쳐서 그랬겠지? 그렇다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니 미안하기 짝이 없군”
“왜 딴데로 얘기를 돌리세요? 그게 아닌데…”
김영선은 비아냥거리며 곱게 눈을 흘겼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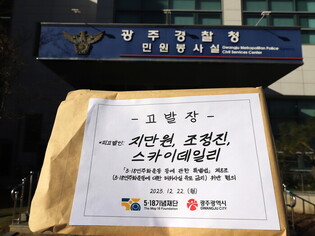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