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특정조직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했으나 불가피한 상황 또는 자의든 타의든 불미스런 결과를 안고 다음 상황으로 떠나야 할 때에는 ‘사퇴’ 또는 ‘명퇴를 빙자한 마무리 모양새 다듬기’라고 논한다.
최근 벌어진 안산시의 육상코치 성추문문제를 시간상 역으로 뒤집어 볼때 용퇴든 사퇴든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견해에 안타까움을 더하게 한다.
유능한 한 사람의 체육인이 20여년 가까이 인생을 투자한 지도자의 길에 대한 마지막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질타에 앞서 오히려 동정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말 17년간이나 몸담아오며 고군분투했던 안산시 육상실업팀의 김모 감독이 불미스런이유로 현직을 떠나게 됐고 그동안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한’으로 남고 말았다.
이유야 어쨌건 아무도 대신할 수 없었던 긴 시간에 대한 보답치고는 냉정한 사회의 잣대가 김 감독의 존립을 방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련의 과정이 지난 뒤 마지막 이정표를 남긴 김 감독의 뒷모습은 적잖은 세월속에 남겨둔 그나마 남은 명예를 송두리째 까먹는 일이 최근 진행됐다.
제삼자가 보더라도 심정이야 이해하겠지만 이미 이 문제를 아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동정보다는 실망에 더 가깝다는 점이다.
비록 용퇴는 아닐지라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향한 원망의 감정보다는 반성이라는 자각이 선행돼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취재에 열을(?) 올리며 그들(육상인)만의 세계에 침범한 외부인으로서 지금이라도 이 사건 발생전 있었던 선후배의 따뜻한 공감대가 넘치는 시절로 돌아가길 바랄뿐이다. 스포츠는 외부인의 인맥관계 및 금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따라서 이미 진행된 문제를 상호간의 상처로 인정하고 마주앉아 붕대를 매주는 광경으로 연출한다면 이 또한 세간이 비난했던 이목을 뜨겁게 달구는 드라마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오히려 안산시청육상계에 부당한 감독내정이 없도록 전임 김감독이 육상계의 거목으로 버텨준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상황은 아무말이 필요없는 침묵속의 뜨거운 목메임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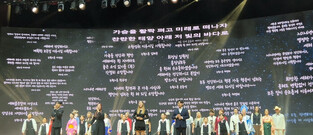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 개장](/news/data/20260105/p1160279068418260_5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