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분방도 좋고 권위의식도 좋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 옛부터 찾아오는 손님에게 최소한 받아들이는 예의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고유의 예절이 점차 사라지는 안타가운 면을 보여줘 답답하다. 예전에 보기드문 권위의식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듯한 느낌이다.
얼마 전만 해도 행정기관이나 일반회사를 방문하면 최소한의 예의를 쌍방이 지키는 것으로 의자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손님을 맞아들이는 미덕이 있어 방문자가 좋은 기분으로 인사를 나누곤 했다. 그러나 일부 공직사회에 스마일이란 미덕이 사라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씁쓸하다. 처음 찾아가는 사람인데 의자에 그대로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한마디로 못마땅하다는 뜻이다.
그뿐이 아니다. 명함을 내놓으면 한 손으로 그것도 앉아서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의자에 앉아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묻는 태도가 참으로 눈에 거슬린다. 운동 삼아 한번쯤 일어섰다 앉으면 좋으련만…
실제로 27일 오후 4시경 B기관 6급 직원을 찾아 명함을 주며 용건을 말하는 50대 민원인이 어이가 없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또 다른 민원인이 찾아와 정중하게 두 손으로 명함을 건네 주는데 한 손으로 받고도 끝내 자리에서 일나지 않는 추태가 연출된다. 다른 부서에 가서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사실 필자도 이같은 황당한 일을 자주 당한다. 그때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가. 아니면 내가 상대에게 좋지 않은 면을 보인 것일까. 돌아 나오며 되씹어볼 때가 종종 있다.
자신을 찾아온 손님에게 정중한 예의를 지키는 것은 서로의 미덕이며 기분을 즐겁게 해 주는 것인데 하며 기관을 나올 때 조금은 허탈하다. 특히 사회가 각박해 질수록 예의를 지켜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사회가 어수선할수록 서로가 작은 미소로 상대를 대하는 모습이 뿌리내릴 때 건강한 사회가 유지된다.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 명함을 내 놓으며 인사를 청하는데 인상을 쓰며 상대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당황하겠는가. 설령(設令) 앉아서 명함을 받았다고 해서 인격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 자칫 교만한 화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것은 권위도 권력도 더더욱 아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작은 예의가 점차 사라지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또한 잘못된 예의가 뿌리내릴까 안타까울 뿐이다. 많은 변화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지만 결코 잘못된 문화가 자리잡는 건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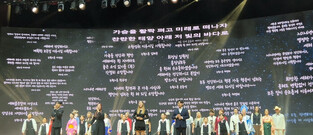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 개장](/news/data/20260105/p1160279068418260_5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