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개발시대부터 지역별로 거점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수출 한국을 이끌어 왔다. 그리고 그런 방식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지역경제 쇠퇴를 방어하기 위해, 1999년부터 지방의 지역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산업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몇 개 지방도시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의 섬유산업, 부산의 신발산업, 경남의 기계산업, 광주의 광산업이 지역경제 쇠퇴를 막고,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려는 정책이 채택되었다. 이렇게 해서 1999년부터 10년 동안 4조원이 투입되고 있다. 4대 도시에 각각 1조원 규모로 투입되면서 이들 지역은 사양화된 산업에 첨단기능을 추가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산업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그러나 대전, 충남북은 정부의 이러한 지역산업진흥정책에서 매우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영호남의 도시들에 비해 약간 뒤늦은 2002년부터 지역진흥사업으로 3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결국 충청권의 3개 시도가 지원받는 규모는 각각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충남의 전자정보단지조성, 영상미디어 산업사업화 센터, 충북의 의료보건산업지원센터, 대전의 로봇산업화 지원센터 등에 모두 3000억원이 지원되는 게 고작이다. 영호남의 대표도시인 부산, 광주에 각각 1조원씩 투입되는 지역진흥사업비가 어째서 충청권에서는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정부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정치세력간의 권력 작용의 산물이다.
이미 서구에서는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결정과 관련, 정부의 정책은 정부활동의 원인과 결과이며 합리적 결정을 가장하고 있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손,’ 즉 권력의 작용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
정부의 의사결정은 자원배분에서 많은 왜곡을 불러왔다. 영호남에 우선적으로 산업정책을 지원하는 의사결정구조가 지방화 시대에도 지역의 현실과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 정책을 답습한다면 국토공간의 합리적인 활용, 공간적인 균형발전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충청권 경제는 수도권의 경제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 면에서 역내로 들어오는 규모보다 수도권으로 역외 유출되는 규모가 더 크다. 따라서 충청권 경제는 충청도 3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경제통합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왜곡된 의사결정을 바로잡는 역할을 병행해가야 한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 권력의 지역 차별적 정책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아닐까?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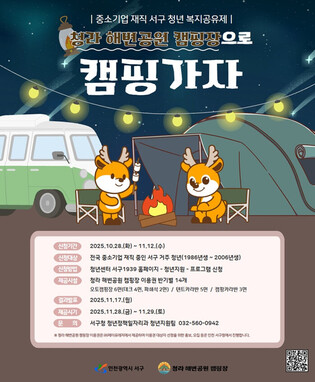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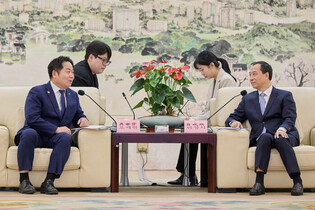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주거정책 포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6/p1160278518713968_66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농업 체질 개선 전방위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5/p1160278371910081_82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1인가구 지원사업 선도모델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4/p1160279219128288_34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민선8기 2주년 구정 성과공유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3/p1160278441427235_44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