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사는 일제 강점기 때 주로 사용됐던 단어로 순사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돌 순(巡)자에 조사할 사 (査)를 사용한다.
한마디로 순사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단순히 조사하는 사람으로만 풀이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통제하고 강제하는 사람으로 밖에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는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한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가 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에게 때를 쓰며 울고 있고 그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기 시작한다. 아무리 아이를 어르고 달래도 아이의 울음이 그치지 않고 있을 때 순사가 그 것을 지켜보며 지나가고 있다.
이때 그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목적으로 ‘저기 봐라. 계속 울면 순사가 너를 잡아간다'라고 하자 그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만다. 물론 이 예는 5-60년대에나 있었을법한 이야기다.
그러나 그 시대상의 순사는 그러했다. 지금의 경찰은 어떠한가. 또 다시 경찰이란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경계할 경(警)에 살필 찰(察)을 사용한다.
한마디로 경찰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 공공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예방활동의 경계순찰을 하는 사람으로 풀이되며 현 경찰은 이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서비스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경찰관은 24시간 자신이 속한 관할에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순찰을 실시한다. 그리고 거동 수상자가 있을 시 그에 대한 검문검색을 하기도 한다.
이는 경찰의 본연의 역할이며 현 경찰은 여기서 치안 서비스가 포함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자동차의 통행을 경찰관의 수신호로 자동차의 통행을 통제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도모한다.
또한 최근 기승 중인 전화사기(보이스 피싱)에 대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홍보물을 제작하여 경찰 스스로가 이를 배포하는 등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국민을 통제하고 강제하는 집단인 순사로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죄 예방 활동 순찰 및 치안 서비스를 통한 진정한 경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여야겠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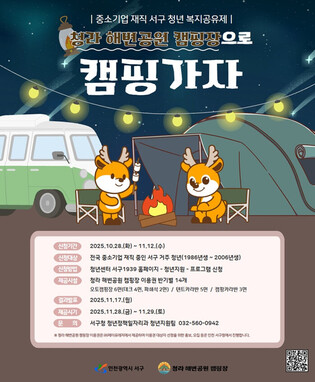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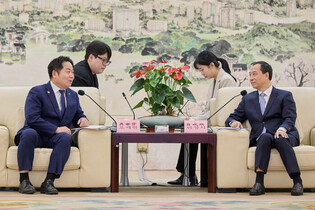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주거정책 포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6/p1160278518713968_66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농업 체질 개선 전방위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5/p1160278371910081_82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1인가구 지원사업 선도모델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4/p1160279219128288_34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민선8기 2주년 구정 성과공유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3/p1160278441427235_44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