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게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느냐”고 물으면 열에 아홉은 당연히 들어보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속는 것일까?
대부분의 전화사기범들은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나 우체국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사기사건에 이용되어 안전한 계좌에 옮겨야 한다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가족의 일원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고 하는 등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빠질만한 상황을 연출하여 상대방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를 주지 않는다. 또,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기관을 사칭하여 넘어 올 때까지 끈질기게 속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피해자들이 ARS로 우체국에서 반송된 등기가 있으니 상담원을 연결하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다. 하지만 상담원과의 전화를 끊은 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같은 국가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으면 처음에는 의심하던 피해자들도 갑자기 불안감에 빠져 속게되는 것이다.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화사기수법에 대한 홍보가 될 즈음 신종수법으로 바꾸는 것도 전화사기가 끊이지 않는 또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수법이 진화해도 전화사기에는 변하지 않는 공식이 있다. 늘 마지막은 개인 정보?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묻고 특정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보안"", ""보호"", ""인증"" 등의 명목으로 번호를 누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전화벨이 울리면 명심하자. 공공 기관?금융 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묻고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는 십중팔구 사기꾼이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 안내 전화나 030, 086 같이 낯선 번호가 찍혀 걸려오는 전화는 일단 사기로 의심해봐야 하고 일체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 의심을 생활화하라는 것 같아 마음이 개운치는 않으나 그들에게 ‘낚이지’ 않으려면 예방이 최선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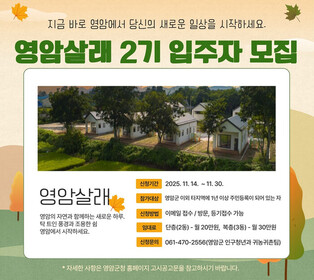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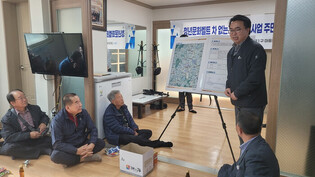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