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봉승 극작가)
얼마 전, 특임장관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면서 ‘소통의 리더십’을 거론하게 되었는데, 소통이란 단순히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실행으로 옮겨 주어야 비로소 소임을 다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실천적 리더십’으로 선정(善政)을 이끌어낸 이가 성군세종대왕임을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성군 세종은 약관이나 다름이 없는 22세의 젊은 나이로 임금의 자리에 올랐으나 그가 거느려야 하는 신하들은 당대의 석학이자 명현들이었다. 정승들만 해도 그렇다. 영의정 황희, 좌의정 맹사성, 우의정 박은 등과 같은 당대의 고매한 인품들이라 그야말로 ‘가라, 오라’는 식의 왕명만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는 형편이었지만, 약관의 세종은 마치 아버지와 같은 노년의 신하들을 거느리며 자신이 생각한 소통의 정치를 완벽하게 이끌어 나갔다면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때를 같이하여 당연한 질문이 나왔다.
“젊은 세종대왕의 완벽한 리더십은 대체 누구의 가르침으로 배운 것입니까?”
“무시무시한 독서량입니다. 책 속의 가르침을 어긋남이 없이 실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군 세종대왕의 독서량을 거론할 때면 ‘책을 묶은 가죽 끈이 닳아서 끊어지곤 하였다.’라는 구절을 상기하게 된다. 책을 묶은 가죽 끈이 닳아서 끊어질 정도라면 같은 책을 몇 번이나 읽어야 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도 어렵지 않다. 화서 이항노(李恒老))선생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중용(中庸)을 외기를 만 번까지 하였는데, 살아서 다시 한 번 왼다면 무엇을 깨닫게 될지 심히 걱정된다.
이 전설과도 같이 엄청난 구절은 이항로 선생이 손수 쓴 문집(일기)에 적혀있어 의심한 여지가 없다. 우리의 얕은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서로 다른 만권의 책을 읽는 일도 불가능할 것인데, 항차 아무리 명저(중용)라 하여도 같은 책을 만 번이나 읽었다면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도 이미 나와 있음을 어찌하랴.
조선의 명현들은 죽음에 임하면 종명시(終命詩)를 지어서 남기는 데 그 구절 중에는 ‘하늘의 이치를 거역하지를 않았고, 책 속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었다,’라는 구절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화서 이항로 선생의 삶은 평생을 워정척사(衛正斥邪)의 화신으로 일관하였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면암 최익현(崔益鉉), 의암 유인석(柳麟錫)과 같은 문도들에게까지도 그와 같은 실천의지를 궁구실행하게 하여 오직 나라를 구하는 일에 목숨을 던지게 하지를 않았던가.
따라서 많은 식자들은 설혹 만권의 책은 섭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명구를 골라 삶의 도반으로 삼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 경우라면 나도 마음에 다짐하면서 평생의 지팡이로 삼는 명구가 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아야 참 군자일 것이니라.
누구나 한 번은 읽었을 논어(論語) 첫 절의 마지막 구절이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참으로 서운하다.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붉히며 짜증을 내게 되고, 때로는 목청을 돋우며 그 불만을 토로하기 십상인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그 모든 울화를 참아 넘기는 것이 군자의 길이라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군자의 길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사노라면 사람들은 나를 일러 도통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책속의 가르침이자 법도일 것이니까.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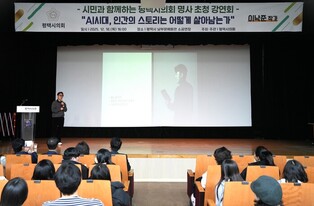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