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기문 변호사) 김능환 대법관이 5. 24. 일제시대 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옛 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 10여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3년3개월간 심리하고 고민하던 끝에 내린 판결이다.
일본 사기업에 의해 강제 징용 당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김대법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다. 특별히 동남아 지역의 경우, 일본 식민지 지배를 겪을 당시 많은 아시안 민족들이 똑 같은 고초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의 영향은 아시아 전역으로 미쳐나갈 것이다. 게다가 이 판결은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이다.
사전에 피해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과 피해자들의 추가소송 가능성등도 검토되었다고 한다. 미쓰비시와 포스코의 한국 자산에 대한 검토도 끝맺음했다. 이 판결로 한일 외교관계가 부딪힐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일본 최고재판소의 이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이 어떻게 갈지도 더 두고 봐야 한다. 이 판결을 가지고 일본내의 두 기업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하려면, 일본에서 다시 집행판결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판결의 영향은 두 번째 문제다. 그 동안 일본식민지 시대에 피해를 보았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로 대한민국 사법사에 길이 남을만한 판결이 될 것이다.
법관의 길은 바로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적확하게 받아주는 위치에 있다. 오죽하면 판결을 구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김능환대법관은 먼저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하여도 보통의 상식을 뛰어넘는 판단을 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한국에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논리를 폈다.
1965년의 정부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하여도 국가권력이 개입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일반 법관이 가지고 있는 법 상식의 논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판단을 한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한 일본 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본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므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얼마나 후련한 판단인가? 주권국가로서의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가져다주는 판단이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모두 위 논리를 개발하지 않고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하지만 김능환대법관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판단을 했다.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의 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김능환 대법관은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그 동안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5억달러의 차관을 1965년도에 받는 대신 개인들의 청구권은 포기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온 상태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2011. 8.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일제시대 위안부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김능환 대법관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과도 맥이 닿아있다.
한·일 관계에 외교적 파장이 올 수도 있지만, 대법관이 이 같은 결과를 모르고 판단하였겠는가? 국민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준 김능환 대법관의 지혜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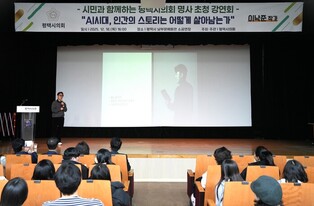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