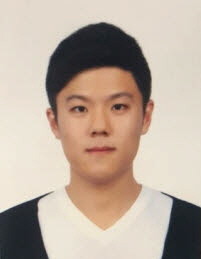 |
||
| ▲ 전형로 | ||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음’이라고 말한다. 청렴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서 청렴도를 높이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도, 선진국가로의 진입도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해 발표한다. 지난해 발표된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77개국 중 52위에 머무르며 역대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35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29위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뇌물과 뒷돈이 통하던 시절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일수도 있으며, 또 하나는 정 많은 대한민국의 정서로 인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잘못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청렴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국격 상승을 위한 ‘기본요건’이 됐다. 성장이 우선시되던 시절, 반부패나 청렴의 사회적 자본보다는 경제적 자본 축적이 미덕이었던 탓에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쯤은 별 죄책감 없이 받아들였다.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시절을 겪지 않은 세대가 사회의 주축이 되면서 더 이상 이런 편법으로는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됐다.
최근 하루가 멀게 터져 나오는 대형비리 사건은 대부분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청렴을 말하면서 굳이 위아래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되새겨 봄직하다.
부패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작용해 발생한다. 그 하나는 ‘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사적 이익’이다. 다시 말해 권력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챙기는 것이 부패다. 부패는 권력과 힘이 있는 곳에 존재하고 지나친 사리사욕으로부터 비롯된다.
선조들의 가르침이 이를 확인시켜 준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말한다.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지름길을 쫓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부패를 능력으로 알던 시대를 관통해왔다. 부패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청렴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는 관행이나 정(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부패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는 척결돼야 한다. 이런 에너지를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시키는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