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지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4년 퇴직한 A씨는 퇴직 전인 2011년 7월과 퇴직 후인 2015년 11월, 2016년 5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3차례 폭행치상·상해를 묶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A씨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절반을 환수하고 남은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재직 중 범죄만으로 처벌받았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감액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재직 중 범죄사실만 보면 죄가 가볍고 폭행 횟수도 1회에 불과해 형사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퇴직연금 제한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A씨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이상 재직 중 범죄에는 어떤 법정형이 선택됐는지 알 수 없다"며 "급여 제한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재직 중 범죄의 양형을 별도로 고려해 심리·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3가지 범죄사실을 묶어 하나의 결론을 내린 이상 개별 범죄사실마다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알 수 없는 만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 전에 있었던 범죄사실만 놓고 자체적으로 형량을 판단해 연금 감액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은 "재판부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모든 죄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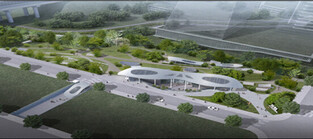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news/data/20251230/p1160278487779617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연말 겨울여행 명소 추천](/news/data/20251228/p1160273383015143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혁신군정' 성과](/news/data/20251225/p1160285318798120_814_h2.jpg)
![[로컬거버넌스]인천관광공사, 연말연시 인천 겨울 명소 추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news/data/20251224/p1160266097659898_2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