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통 미덕인 ‘공동체 의식’이 지난 60년대 이후 불붙기 시작한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퇴색돼, 이른바 ‘님비주의’로 변질돼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들의 기억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보면 겨울철 함박눈이 내리는 동네 어귀에 이웃들이 손에 손에 가래나 삽 등 제설도구들을 들고 힘을 모아 쌓인 눈을 치우던 장면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아니 형님이나 누님들 세대만해도 나밖에 모르는 세태가 요즘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취급되진 않았다. 비록 이번 폭설 때 나타난 내 집앞 눈치우기가 일부 지역에 그치긴 했어도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의 마음 한 구석엔 여전히 전통 미풍양속에 대한 향수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내 각 구청들이 이번에 보인 ‘제설행정’은 과거의 ‘뒷북행정’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기상청의 폭설 예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청 상황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동되고 있었다. 근무인원을 늘려 배치하는 등의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인원을 점검하고 장비를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할말은 있을 것이다. 고질적인 인원 부족과 장비 미비 등으로 어느때보다도 공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해서 제안한다. 겨울철 내 집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는 주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번을 계기로 ‘내 집앞 눈치우기’를 제도화하면 어떨까?
“여름 장마철엔 자신의 집에 빗물이 들어왔다고 구청에 전화하고, 동네 어귀에 마구버려진 쓰레기를 왜치우지 않냐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접할 때마다 공복이라는 마음가짐이 흐트려지는 것만 같아 안타깝습니다”
기자가 만난 어느 구청 사무관의 말이 늘 귀전을 맴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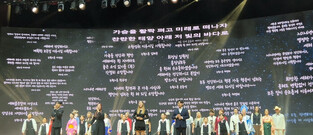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 개장](/news/data/20260105/p1160279068418260_5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