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다수의 정신장애인이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장기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등록 정신장애인 375명과 이들의 가족 1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당사자·가족·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FGI) 면접조사 등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응답자 중 85.5%가 정신병원 입원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2.2%가 1년 이상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입원한 경우도 16.6%에 달했다.
입원이 장기화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어서'(22.0%), '가족 갈등 때문에 가족이 퇴원을 원치 않아서'(16.2%), '병원 밖에서 정신질환 증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13.3%), '지역사회에서 회복·재활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서'(8.1%) 등 순으로 조사됐다.
치료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장기 입원을 택하는 셈이다.
또한, 이들의 평균 입원 횟수는 4.8회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본인 스스로 입원한 경우는 1.8회에 불과했다.
부모·형제·배우자 등 가족이 입·퇴원을 결정한 경우가 각각 69.7%와 56.4%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경우는 각각 19.8%와 20.9%였다.
정신장애 회복에 도움을 준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꾸준한 약물 복용’이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신과 외래 진료'(15.4%),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와 같은 전문가 상담'(14.0%), '정신병원 입원'(11.4%), '가족의 지지와 지원'(11.1%) 순으로 나타났다.
함께 실시된 초점집단 면담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병원과 지역사회의 정신 재활서비스기관과 정신건강 복지센터 간 연계 미흡, 지역의 심리·상담치료서비스 부족, 회복·증상 수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부재,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역할 미흡 등으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 개정 등 정신장애인의 입원과 치료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그에 따른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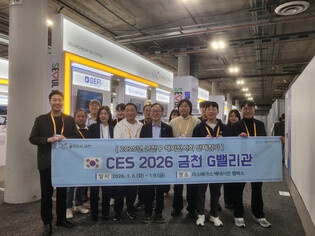







































![[로컬거버넌스]인프라 혁신으로 '체육르네상스' 연다… 인구 유입 늘고 지역상권에 활기](/news/data/20260111/p1160275997812534_36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