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 구름 한 점 없다. 바람 많은 풍다(風多)의 제주도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즈넉하고 쾌청한 날씨다. 이만성의 집에 기상천외의 사나이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한 불청객, 그러나 더없이 반갑고 소중한 진객(珍客)중의 진객이었다. 이만성이 한남마을 ‘영재의숙’에 야학강사로 취임한 이튿날이자 또한 김선영양을 만나 뜨겁게 사람을 속삭인 바 있었던 이튿날 오후였다. 이만성이 점심식사를 끝내고 나서, 한남마을에 다녀오려고 막 집을 나서려는 참이었다.
“실례합니다. 아, 마침 이형 집에 계셨군요”
불청객은 들뜬 목소리로 환호성을 올리며 성큼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아니, 이게 누구야? 서 중위님 아니십니까?”
눈을 크게 뜨며 이만성도 마주 환호성을 올림과 동시에,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진맥진 힘이 빠질 때까지, 요란하게 악수를 했다.
“연락할 길이 없었어요.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새 별고는 없었겠지요? 선생님은 지금 안 계십니까?”
일본군 육군중위였던 서병천(徐炳天), 그는 언제 군인이었더냐는 듯이 예의바른 도덕군자의 이미지를 떠올리느라 안간힘을 쓰는 눈치였다. 그래서 그는 시큰둥하니 붙잡은 손을 놓으면서, 인사치레로 이양국에 대해 안부 묻는 것을 잊지 않았다.
“염려해 주신 덕택에 집안에 별고 없었습니다. 마침 아버지는 집에 계십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이만성은 놓았던 손을 다시 붙잡아 끌어당겼다. 서병천은 곧 툇마루 위로 올라섰다. 그때였다. 방안에서 책갈피를 뒤적이고 앉았던 이양국이 귀에 익은 목소리잖아! 하고 대청마루로 걸어나왔다.
“아이구 선생님! 마침 계셨군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서병천은 무릎 꿇고 너부죽이 엎드려 절을 했다.
“귀에 익은 목소리다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였는데, 서 중위를 만나게 되다니 꿈같기만 하군! 그래 그동안 죽 제주땅에 있었던게야? 아이면 고향에 갔다가…? 고향이 경기도 개성이랬잖아?”
“네, 그렇습니다. 개성에 갔다가 제주도를, 아니 선생님과 만성형을 몽매에도 잊을 수가 없어서, 부랴부랴 달려왔지 뭡니까. 무장해제가 되기 바쁘게 제주도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을 못 뵙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찾아와줘서 고맙네, 군복 벗은 다음엔 만나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체념하고 있었는데, 자네야말로 사나이 중의 사나이일세. 새 시대를 맞았으니 만큼 나라와 겨레를 위해 톡톡히 한몫 해야겠지? 무엇보다도 다시 만나게 되고 보니 감회가 새롭고 무척 반갑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같은 사람을 잊지 않고 머릿속 깊이 간직하고 계셨다니, 정말로 찾아뵌 보람을 느끼게 되는군요”
곧 주안상이 들어왔고, 세 사람은 제주도 특산 막걸리를 들면서 가슴 활짝 열고, 많은 얘기를 나누며 회포를 푸느라 시간가는 줄도 모를 정도였다. 서병천과 이만성-이 두 사람은 글자 그대로 기연(奇緣)으로 맺어진 ‘죽마고우’ 이상의 절친한 친구사이였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5월 중순 어느날 오후의 일이었다. 서울에서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 돌아온 이만성은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면서 일각이 여삼추로 전정애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날 이만성은 급한 볼일이 있어서, 관광면사무소에 들렀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람 살려줍서!”
아니, 저 저것은…일본군인들이 젊은 여자를 겁탈하고 있지 않은가? 부대 가까이로 다가갈수록 묘한 육감이 머리털을 쭈볏거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천외동’ 냇가 널따란 벌판 위에 일본군 1개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이만성은 냇가로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사 사람살려! 한저 사람 살려줍서 예!”
여자의 애끊는 울음소리였다. 눈이 확 뒤집혀 버린 이만성은 폭발하려는 적개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물불을 가릴 때가 아니다 싶어 비호같이 사건 현장으로 달려나갔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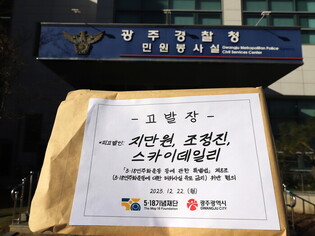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