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판자들 중에는 국적법과 재외동포법을 동일시하거나 혼동하는 분들도 보입니다만 재외동포법은 국적법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개정 국적법 통과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구(舊)’ 한국인들은 2032명입니다. 6월 29일에 상정 부결된 동포법 개정안은 이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서 이들이 더 이상 동포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자동적으로 이들에게는 동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의 박탈이 뒤따르게 됩니다. 한국 국적자가 아닌 재외동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크게 보아 입국과 체류의 편의, 취업과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의료보험의 적용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 박탈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2002년에 개정된 법무부 규칙 ‘이중국적 소지자에 대한 국내거소신고 업무처리지침’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물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은 참으로 괘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는 이제 한민족도 아니고 우리 핏줄도 아냐”라고 법으로 못박아버리는 것이 모국으로서 과연 온당한 일인가요? 저는 결과로서의 특권 박탈보다 이같은 주홍글씨 낙인찍기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적 이탈은 부모들이 선택한 문제이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자신이 한국인들에 의해 동포로서의 핏줄조차 부인 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받게 될 상처가 저는 슬픕니다.
개정 이전의 국적법이 이중국적자들에 대해 만 18세를 국적 선택의 분기점으로 삼았던 것은 당사자의 선택권까지도 염두에 둔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적을 이탈한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짧았던 부모의 생각과는 달리 어떤 나라의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가 돌아오고 싶은 조국, 그리운 동포들이 사는 나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기보다는 제 양심의 소리에 충실하는 것이 좋은 정치를 실천하는 요체라고 믿습니다. 이 김에 한마디 덧붙이면 저는 우리나라가 박애가 넘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좋은 나라로 세계와 동포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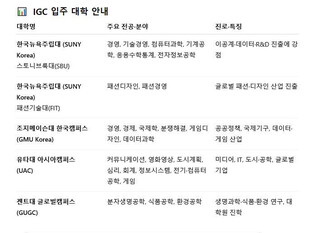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