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방문지인 홍콩은 서울의 약 1.8배 면적에 인구 670만이 사는 하나의 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20만 가구를 대상으로 방송업계는 무료로 제공되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에다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그리고 IPTV가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IPTV가 상당한 수준으로 준비된 상태지만 이를 통신으로 볼 것인지, 혹은 방송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합의를 도출해 낸 홍콩을 보면서 우리의 경우 부처간의 이기주의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박탈하고 있지나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해서 좀 씁쓸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인 프랑스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방송허가를 할 때 최초 허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재허가 시에는 5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10년 정도의 기한을 부여해야 사업자들이 적정 투자를 통하여 질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인 핀란드는 방송규제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교통통신부에서 방송정책을 입안하고 방송사업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IPTV는 실험방송 중이며, 인터넷 보급율은 60% 정도로 EU회원국 중 3위를 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IPTV 인구도 곧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3개국은 각각 IPTV의 성장을 예견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은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매체를 만들어 낼 것이며, 자연 시청자들로부터 보다 질 높은 콘텐츠를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3개국의 IPTV현황을 둘러보니 그간 복잡해 보이던 문제가 상당 정도 단순 구도로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통신은 기술이자 수단이며, 방송은 콘텐츠이자 목적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기술이 초고속으로 발달한다고 해도 기술은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이 발달하면 하는 만큼 그 전달 매체와 방법이 다양해지고 편리해 지는 차이가 있겠지요. 따라서 방송·통신을 통합하는 기구를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도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될 경우에도 여전히 기술과는 상관없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콘텐츠는 분명 방송의 영역에 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글은 시민일보 3월 17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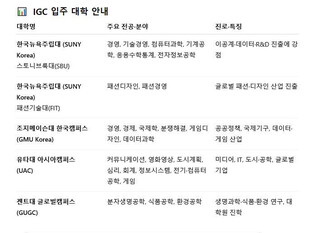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