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간의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상사나 선배의 명령에 후배의 복종이 있을 뿐이다. 하기 싫은 일도 예스, 가기 싫은 술자리도 예스. 속으로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어찌 소화가 될 것인가. 소화불량에 걸리고 겉으로 내색은 못하고, 이른바 ‘화병’이란 게 생겨난다.
물론 조직도 상사도 이런 순종적인 사원을 그리 반기지만은 않는다. 시키는 일은 그럭저럭 하는데 알아서 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처럼 새로운 것, 반짝이는 것이 칭송받게 된 시대에는 ‘노 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노 맨’… 일견 멋있어 보인다. 상하 가리지 않고 자기 할 말은 할 줄 아는 사원, 줏대 있고 의식 있는 사원, 능력이 출중한 사원….
하지만 ‘노 맨’은 잘난체, 아는체, 싸가지 없는 사원으로 통하기도 쉽다. 요즘같이 각박한 때 자칫 왕따의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래서 ‘예스 벗 노’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나와 다른 생각이나 행동은 서로간에 (-)전류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상대방이 가장 잘 이해되는 경우는, 1) 상대방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때이며, 2) 나도 상대방같은 말과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을 때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부딪혔을 때, 한마디로 ‘노’를 접했을 때, 사람은 정신적 당황에 잠깐 빠지게 된다.
물론,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은 당연하다는 서로간의 약속(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으로 그 순간을 넘어가지만, 다르다는 사실이 (-)에너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예스 벗 노’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간의 대화에서 나와 같은 생각이나 행동은 서로간에 (+)전류를 만든다. 위와 똑같은 두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류가 생겨난다.
그래서 내가 ‘노’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사고 속에서 ‘예스’라는 (+)전류를 만들 수 있는 멘트를 뱉은 다음에 ‘노’로 이어지는 멘트를 날린다면, 앞의 (+)전류에 의해 뒤의 (-)전류는 충분히 중성화 될 수 있고, 나는 나의 실속을 차릴 수 있다.
‘노’를 말한다는 것은 내 주장을 쫓아가는 것이며,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여러가지로 인해 세상의 눈치를 보다가 나의 이익을, 실속을 잊어버리게 될 때, ‘예스 벗 노’를 생각하라.
아니면 말고… 준사마
위 글은 6월1일자 시민일보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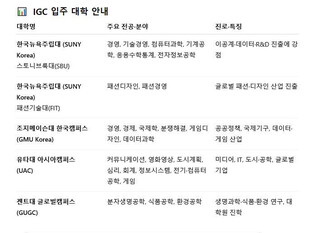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