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소도와 군대, 정신병원, 학교에는 일종의 관통하는 논리가 있다. 대상자들은 잠재적인 일탈행위자이며 따라서 통제를 위한 감시, 체벌 등이 필요하며 정당하다는 것이다.
체벌이 학교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입장도 이런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이며, 잠재적 일탈행위자라는 기본 전제가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하기에는 부족한 인간이고,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나, 신체를 통제하는 방식이 하나의 교육방법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교육이 한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당한 논리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체벌이 유일무이한 교육방법이 아닐 경우에야 더욱 그렇다. 학생들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은 통제적인 근대 국가교육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근대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혹여 학생들이 미성숙한 존재라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
체벌이라는 교육방법을 용인하는 순간 체벌은 가장 손쉬우면서도 단기적 효과가 명확한 지도방법으로 오남용 될 수밖에 없다. 체벌을 용인하고, 학생의 신체를 규제하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은 숨쉴 수 없다. 공부를 위해서는 두발을 규제해야 한다는 감시의 시선 속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은 살아날 수 없다. 내재화된 폭력의 악순환은 학교와 군대를 통해서 재생산되고, 사회는 폭력과 인권 침해를 용인하는 내성을 가지게 된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체벌을 법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다. 체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 인권침해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 나라에서 체벌을 금지했다고 해서 교육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혹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체벌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 문제를 체벌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닐 것이다.
물론, 체벌문제는 여러 다른 문제의 해결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체벌을 정당화하는 지독한 입시교육을 해체해야 할 것이며,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을 위한 물적 조건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교사의 전면 배치를 통해 학생에 대해서 통제적 지도가 아닌 상담적 조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체벌은 교육을 빙자한 폭력일 뿐이며, 두발규제는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감시의 시선일 뿐이다. 이제 이 폭력의 재생산 고리를 끊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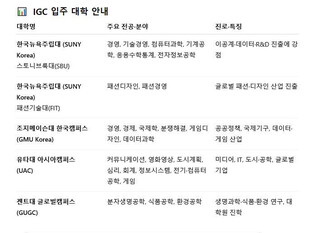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