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의 주택정책을 보면 조변석개(朝變夕改)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아침에 세운 정책이 저녁이면 바뀌는 식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전세난 등 주택난이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자 폐지했던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부활하는 한편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넘어 거품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자 지난 1월 초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강남권 분양권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메스를 들이댔다.
그러나 일련의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등 이의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3.6 주택경기 안정대책’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더욱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았다.
여기서 문제는 최근의 일부 부동산 투기와 분양가 및 아파트값 상승은 정부가 일정부분 방조했던 것들이라는 데 있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소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가 발표됐을 때 부동산관련 전문가들은 분양가 자율화가 전반적인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져 저금리 속에 부동산 투기만을 야기 시킬 수 있음을 경고했었고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예상치 못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은 모두 24회나 발표됐다고 한다. 평균 두달에 한번 꼴로 주택관련 정책이 나온 셈이다. 외환위기 등으로 각종 부양책이 필요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숫자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이 장기적 안목에서가 아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시방편식으로 대처하는 단기대응에만 급급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주거안정이다. 주택정책을 결정할 때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이 국민의 주거안정인 것이다.
정책을 내놓기 전에 사전에 파생효과와 결과를 놓고 주거안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많은 주택정책이 필요했을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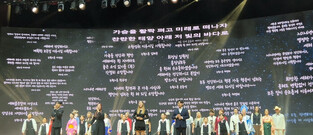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 개장](/news/data/20260105/p1160279068418260_5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