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히딩크 감독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비교하는 대화가 자주 등장하곤 한다. 고질적인 결점으로 지적됐던 문전처리와 슛의 적중력 등이 히딩크 감독 영입후 몰라보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그는 또 한국팀의 체력만이 아니라 경기와 상대를 파악하는 눈과 머리까지 바꿔놓았다. 선수들은 어떤 위치를 선점해야 하는지, 동료가 공을 잡으면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 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었고 공격과 미드필더의 조화, 수비진의 조직력과 커버플레이는 선진 축구에 비해 그다지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리더의 결정과 의지가 조직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축구 감독의 게임운영과 자치구의 행정수장의 경영은 닮았다고 볼 수 있다.
자치구를 이끄는 구청장의 리더십과 감독의 팀 장악 능력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히딩크는 선수 선발 때 과거의 명성과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학연과 지연을 배제시킨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 기업이나 자치구들의 상사들은 부하를 ‘업무 그 자체’보다는 근무시간, 복장, 충성심, 태도 등으로 평가해 왔다.
지난 2일 민선 구청장 3기가 출범하면서 직원들은 곧 있을 인사에 술렁이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 바뀐 자치구 직원들은 보복성 인사에 좌불안석이며 구청장이 연임된 자치구는 선거때 고생한 직원들을 승진시키거나 주요 보직으로 발령내는 등 학연·지연에 따른 인사를 거듭해 왔다.
이같은 풍토에서는 히딩크처럼 실력에 의한 인재중용과 기초에 충실한 과학적 조직운영 등은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는 ‘히딩크형 구청장’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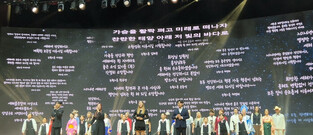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 개장](/news/data/20260105/p1160279068418260_5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