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은 노사정위원회의 이름을 빌려 ‘지난 1년간 행자부 및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부 등과 협의한 결과 공무원노조의 형태 등 여타 사항엔 합의했으며 허용시기나 노조명칭에 입장차이가 갈려 결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측의 주장대로 다시 풀어본다면 ‘노사정위원회 및 관계자들이 시간에 쫓겨 현상황 그대로 날치기식 통과를 시도하려 했으나 노조 관계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결국 실패했다’는 표현이 맞다.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왜곡보도 여부가 아니다. 핵심은 노조명칭 여부 등의 껍데기가 ‘왜 노조라는 이름으로 뭉쳐야만 하는가’ 라는 정수를 가리는데 있다.
노조의 존재의미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공직협법이라는 악법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공직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 법은 사실 공직협의 활동을 옥죄어 왔다. 이 법대로 하다가 많은 조합원들이 초기의 열정을 잃어버렸고, 현실에 안주하는 전형적인 공무원(?)이 됐다. 활동시간 및 전임제를 제한시키는 법적 문구 때문이다. 물론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 보다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 실마리를 노조합법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개별 공직협의 한계 때문이다. 구청측이 공직협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단일 공직협으로선 대응이 막연하다. 실제로 최근의 직권면직 인원구제와 관련 구청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직협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성으로 구청장과 대등한 자세로 협의를 할 수 없었고, 각 지부의 단합이 이뤄지지 않아 힘있는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 노조는 공직협과 공무원노조의 두 개 체제를 고수하며 단일화를 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행자부 및 기초단체장들은 공직협과는 다르게 노조를 지켜보며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입법절차가 정부쪽에 이관된 현재, 앞으로의 상황이 노조쪽에 불리하게 전개될 거라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재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대비, 노조로 뭉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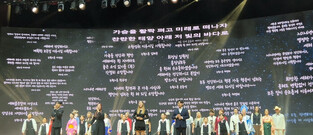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 개장](/news/data/20260105/p1160279068418260_5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