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에선 장상 씨와 장대환 씨가 인사청문과 관련되어 총리 지명에서 낙마(落馬)한 적이 있다. 한나라당은 두 사람의 부동산 보유와 위장전입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두 사람은 사퇴하고 말았다. 매일경제의 장대환 사장은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도무지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물론 일간지의 사주(社主)가 총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노 정권에서 통일부장관으로 지명된 이재정 씨는 정책노선을 두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집중타를 맞았다. 이재정 씨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곤혹을 치렀다.
지난 주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와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인사청문회가 과연 필요한가?”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특히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는 한편의 코미디였다.
도무지 현 후보자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다운 답변을 하지 못했다. 부동산 탈법 증여 의혹을 묻는 의원에 대해 밑도 끝도 없이 “아니다”고 답했다. 증여가 아니면 왜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재산이 자신 명의로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다른 의원이 “오토바이를 타느냐?”고 물어 본데 대해서도, 현 후보자는 “안 탄다”고만 답했다. 그러면 헬멧을 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에 주로 발부된다는 안전장구 미착용 범칙금이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부과됐는지에 대해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현 후보자는 자신이 대북정책에 강경해서 통일부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생각해서인지 도무지 자기 소신을 밝히지도 못했다. 이를 보자 못한 송영선 의원이 친절하게 훈수를 두기에 이르렀고, 현 후보자는 맥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강남우파’의 초라한 초상(肖像)이라고나 할까.
교수 출신인 박선영 의원은 현 후보자의 교수 승급논문까지 찾아내서 자기 표절을 따져 물었다. 현 후보자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그것 역시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할 수 없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국내 학계에 연구윤리가 제대로 서있지 않았다고 답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했을 것이다. 박선영 의원이 잘 알지 못했던 것은 남의 번역한 책을 제대로 감수도 하지 않고 자기가 번역했다고 출판하는 행위도 ‘논문 재활용’ 못지않게 비윤리적이며, 그 점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2005년 12월, 한국경제신문이 나한테 당시 번역되어 나온 ‘라이트 네이션’이란 책에 대한 서평 기고를 부탁했다. 아마도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에 대해서 나 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이다. 나는 그 책의 영어 원전(原典)은 읽지 않았지만 미국 신문에 난 북리뷰를 통해 내용은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번역된 책을 여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번역이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역자가 한나라당의 ‘미국통(通)’이며, 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장인 박진 의원이라는 데 있다.
박진 의원은 미국 워싱턴에 갈 때면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것이다. 덜레스 공항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존 포스터 덜레스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라이트 네이션’에는 여기저기에 ‘덜레스’가 ‘둘스’로 번역되어 있다. 그 외에도 틀리거나 우습게 번역한 곳이 즐비하다.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은 이런 책은 서점에 내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이 책은 박진 의원이 번역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초역을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번역된 원고를 제대로 읽어보기라고 했으면 이런 엉터리 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가 과거에 쓴 논문을 재활용하는 것이나,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번역 책에 자기를 역자라고 올리는 것이나 비윤리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우리 사회의 윤리기준이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와 같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몇 년 전에 한 방송인이 자기가 번역하지도 않은 책을 자기가 번역했다고 이름을 올렸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방송국을 떴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방송인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이 국회의원과 장관에 적용된 기준보다 더 높다는 말인가. 지난주에 있었던 인사청문은 윤리기준이 실종된 현 정권의 모습을 보여준 ‘슬픈 코미디’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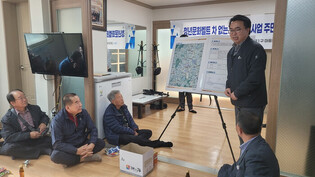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