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NEW, CJ엔터테인먼트 제공 | ||
산악인 엄홍길의 이야기를 담은 ‘히말라야’(감독 이석훈)는 휴먼원정대까지 ‘그들’의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 하지만 관객들은 영화를 본 후 공감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눈물의 온도 또한 더욱 뜨겁다. 올해 초 개봉한 영화 ‘연평해전’(감독 김학순)을 보았을 때와 비슷한 벅참이다.
‘히말라야’는 해발 8,750m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데스존에서 목숨을 잃은 故 박무택 대원(정우)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기록도, 명예도, 보상도 없이 엄홍길 대장(황정민)과 휴먼원정대가 목숨을 걸고 나서는 이야기를 다룬다. 산 아래 또 다른 가족이었던 엄홍길과 원정대의 가슴 뜨거운 동료애가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그날,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 이남지역에서 북한의 무력 기습도발이 일었던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과 그들의 동료, 연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렸다.
두 영화 속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면서 결코 겪어보지 못할 일들일 수 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연평해전’은 6백만 명을 동원했고, ‘히말라야’는 개봉도 전에 입소문만으로 큰 흥행이 예상된다. 일반인들에게 ‘그들’의 이야기가 통하는 것은 ‘동료애’가 밑바탕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평해전’을 본 여성 관객들은 군대를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눈물을 쏟아냈고, ‘히말라야’를 보고선 등산을 취미로 하지 않아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해당 집단에 대한 공감보다는 해당 관계에 대한 공감 때문일 것.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삶을 살아가며 학교, 직장, 동호회, 친구 등 어느 한 집단에라도 소속되어 있다. ‘연대감’이 이를 지탱하는 가장 주된 기본 요소다. 연대감이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동료애’로 변화하는 데까지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해당 과정들을 경험해 본 우리들은 비록 가상이라 해도 꽤 쉽게 참전용사도 될 수 있고, 휴먼원정대원도 될 수 있다. 공감이 되기 때문에 웃음과 눈물이 나든, 웃음과 눈물로 인해 공감이 되든 ‘연평해전’과 ‘히말라야’는 세 감정을 억지스럽지 않게 자아낸다. 그러면서 뜨겁게 폭발한다.
새삼 ‘엄홍길은 좋은 대장 이었을까’라는 고민도 할 수 있겠다. 기상조건으로나 그의 몸 상태로 보나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시체를 찾으러 떠나는 모습은 ‘동료로서의 도리’로써도, 한편으로는 ‘미친 짓’으로도 보일 수 있다. 처음엔 선뜻 나서길 꺼려했던 대원들이 뒤늦게나마 ‘휴먼원정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동료에게 지킬 수 있는 동료애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대원들에게 엄홍길은 신뢰할 만한 리더였다.
오로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던 이들이 죽은 동료를 위해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의 변화는 뭉클하다. 16일 개봉.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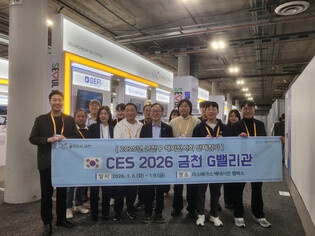






































![[로컬거버넌스]인프라 혁신으로 '체육르네상스' 연다… 인구 유입 늘고 지역상권에 활기](/news/data/20260111/p1160275997812534_36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