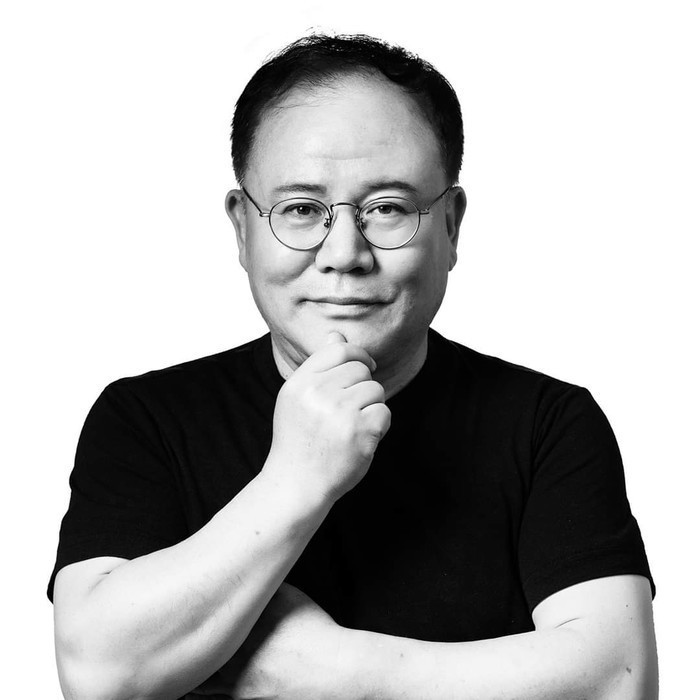 |
정의(justice)의 여신을 디케라고 부른다. 희랍어로 디케(dike)는 “둘로 나눈다(dichazo)”는 말에서 유래했다. Platon의 저서 『국가(Politeia』의 부제는 “정의에 대하여(peri dikaiou)”이다.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를 정면으로 부정한 Michael J. Sandel은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라는 저서를 통해 정의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인 행복, 자유, 미덕을 제시한다.
첫째, 정의가 행복을 줄 수 있는가? 그에 대해 양적 공리주의적 해답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나머지 소수는 불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주의”가 최선의 답이라고 본다.
둘째, 정의가 자유를 주는가? 이에 대한 답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답한다. 외부로부터 강제가 없는 자유, 즉 소극적 자유(~로 부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극적 자유를 억압하거나 통제하면은 사회나 국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국가를 야경국가라고 한다.
셋째, 미덕이 정의를 보장하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도덕적 표현인 공동선(common good)을 추구하는 것이라 보고 이 방식을 지지한다. 공동선이란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공정(fairness)하게 분배되고 공평(equality)하게 이익(interest)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 이익(common interest)'의 개념을 사용해 '올바른' 헌법은 공동이익을 따르고 '잘못된' 헌법은 통치자의 이익을 따른다고 구분하였다.
이후 자신의 또 다른 저서인 『공정하다는 착각(원제: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에서 귀족제 사회와 능력주의 사회 둘 중 어느 사회가 더 정의로운가라는 화두를 던진다. 답은 뻔하다. 현재의 금수저 출신은 귀족사회를 또 현재의 흙수저 출신은 능력주의를 선호할 것이다.
원제에서 보다시피 “능력주의의 힁포(The Tyranny of Merit)”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교만함이 자신과 비교하여 능력이 뒤떨어지는 사람을 천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이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공정(fairness)과 공평(equality)의 무게를 중요시한다.
샌델 교수의 화두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기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 하는 의문으로 기울어진 사회 저 넘어 도사리고 있는 ‘능력주의의 덫’을 해체하려고 한다.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을 이끈 큰 원동력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점진적 개혁주의자이다. 샌델 교수처럼 능력주의를 덫으로 보고 이를 해체하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화두는 ‘공정’에 있다.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하는 것이 능력주의이다. 『The Tyranny of Merit』 p.14p에 “For the more we think of ourselves as self-made and self-sufficient, the harder it is to learn gratitude and humiltiy”라는 글귀가 인상적이다. 우리 스스로 자수성가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와 겸손을 배우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And without these sentiments, it is hard to care for the common dood.” 즉, 이런 정도의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공동선을 돌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엘리트 계급이 자신의 성공적인 결과물을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는 자만심으로 거만해지면 안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페러디해보자면 과연 엘리트를 위한 이익이 공동선일 수 있는가이다.
투입(기회)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그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정의로워진다. 공정과 정의는 서로 독립변인이면서 동시에 종속변인이기도 하다. 즉,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는 바로 “평등-공정”이며 이를 통해 정의가 실현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올해 분야별 주요 청사진 제시](/news/data/20260122/p1160279175155979_90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강도 주차장 정비계획 안정화 단계](/news/data/20260121/p1160278837266287_320_h2.jpg)
![[로컬거버넌스] 강범석 인천시 서구청장, 새해 구정 청사진 제시](/news/data/20260119/p116027880947002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공간·교통 분야 혁신 박차](/news/data/20260118/p1160285211793310_62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