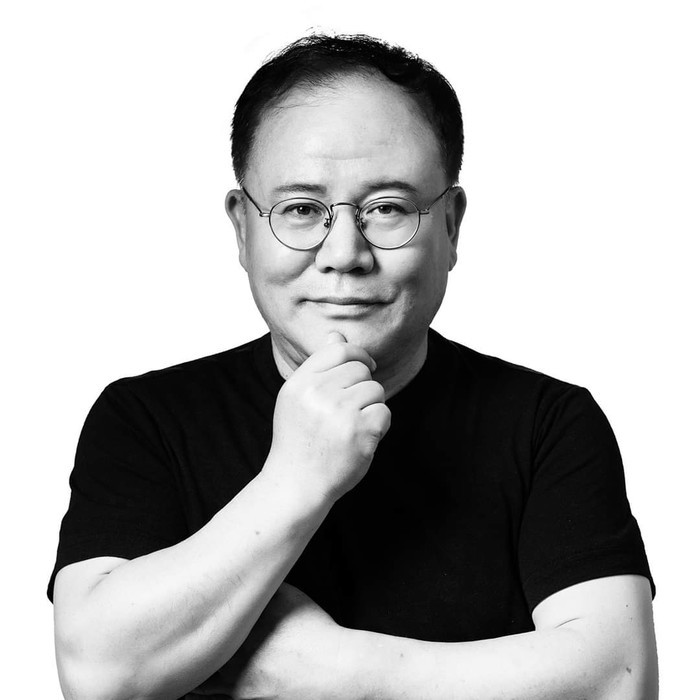 |
세월이 하 수선하다. 이 모두 중용의 덕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다.
중용 제1장은 유교의 철학 개론서이며 동시에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1장에 대한 이해가 중용을 이해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제1장 첫 구절 “天命之謂性(천명지위성: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率性之謂道(솔성지위도: 성에 따름을 <도>라 하고) 修道之謂敎(수도지위교: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은 우주론적인 논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소박한 삶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性)→도(道)→교(敎)로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출발은 性에 있다. “솔성(率性)”이란 하늘이 정한 본성(本性)을 따른다는 뜻으로 도덕적 본성을 충실히 따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도덕적 본성은 성선(性善)에 있다. 인간의 본성은 선(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솔성을 따르는 행위가 우리가 가야할 길(도:道)이다. 즉, 인간에게 당연히, 마땅히 따라야 할 길(道)이 무엇인지를 가르쳐(敎) 주어야 한다.
착함의 대명사인 성(性)은 하늘의 지엄한 명령, 즉 천명(天命)으로써 인간이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정언명법이다. 칸트(Kant)의 정언명법(定言明法)은 이 '선함'의 근거를 개인적인 욕구나 충동인 희노애락과 자신만을 위한 이익에서 벗어나서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보편법칙에 해당된다. 모든 자신의 행위가 보편적 법칙에서 벗어 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성(性)이란 “도덕적 인간 본성이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악한 본성이 발현되어 위험하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도덕적 본성(솔성:率性)에 어긋난 행위이며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 됨을 위해 가야 할 길(道)을 갖게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솔성이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적 선택을 갖고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올바른 길(道)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솔성”이 바로 “길”이 되는 것이다(率性之謂道).
중용의 제 1장에서는 중용(中庸)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중(中)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4가지 감정인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것이 아직 발현되어 나타나지 않음[희노애락지미발(喜怒哀樂之未發: 희로애락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中이란 감각적인 그 무엇(희노애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으며, 지나침도 미치지 못함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불편불의무과불급: 不偏不倚無過不及).
용(庸)은 변하지 않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은 세상의 올바른 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용'은 세상이 이러이러하게 돌아간다는 이치를 의미한다. 동양에서 중용은 화목하다는 의미에서 화(和)에 해당한다. 극단적인 것의 투쟁이 아니기 때문에 화(和)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미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실천적 지혜를 중용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德)은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않은 '중간(mesotes)'에 존재한다는 고 보았다.
예를 들면, 쾌락이 너무 지나치면 방탕한 것이고 너무 모자라면 무감각하다고 본다. 그 중간인 중용을 지키면 절제(節制)라는 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재벌 2세나 연예인들에게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마약의 문제는 중용이라는 절제의 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절제란 방종에 흐르지 않도록 비이성적 욕구를 합리적 이성으로써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節制(절제)를 파자하면 우선 ‘마디 절(節)’은 대나무 죽(竹)과 즉(卽)이 합쳐진 글자로써 ‘대나무’가 커서 올라가면서 생겨나는 ‘마디’를 뜻한다. 다음으로 ‘만들 제(制)’는 ‘칼(刂)‘로 베를 제단하여 수건(건:巾)을 만드는 것이다.
Platon은 절제를 모든 영혼의 부분과 모든 계층에게 요구되는 덕으로 보았다. 여기서 모든 계층이란 국가 전체의 각 부분을 의미한다. 국가의 각 기관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절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해 큰 참사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절제란 쾌락과 욕구의 억제하는 것이다. 일종의 질서와 같은 개념인 것이다.
세월이 하 수선하다.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개인적인 일탈도 중용의 덕이라 할 수있는 절제의 선을 넘어서 일어나는 것이고 국가적인 사건 사고 절제를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다. 즉, 질서의 파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제 질서를 바로 잡아서 국민이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그 책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여야 정치인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올해 분야별 주요 청사진 제시](/news/data/20260122/p1160279175155979_90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강도 주차장 정비계획 안정화 단계](/news/data/20260121/p1160278837266287_320_h2.jpg)
![[로컬거버넌스] 강범석 인천시 서구청장, 새해 구정 청사진 제시](/news/data/20260119/p116027880947002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공간·교통 분야 혁신 박차](/news/data/20260118/p1160285211793310_62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