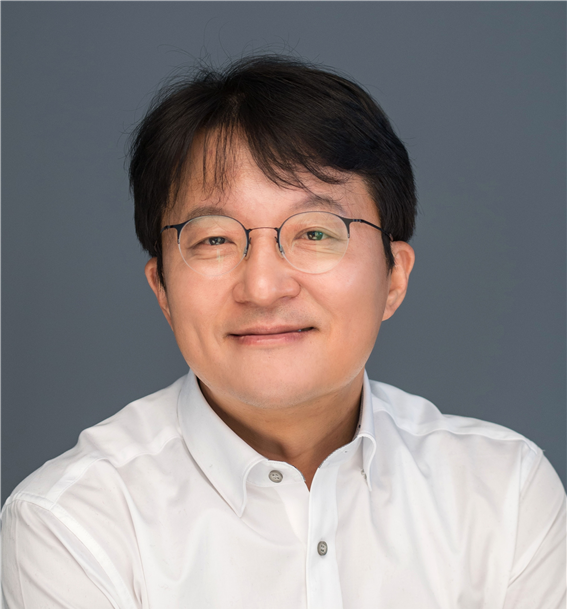 |
| 사공정규 교수 |
매일 혼자서 운동하는 것과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 어느 것이 건강에 더 좋을까. 세계적인 가족치료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매일 혼자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하루에 20분이라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건강과 장수에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미시간대 노년학연구소의 루이 버브루그와 제임스 하우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사이가 나쁘면 병에 걸릴 확률이 약 35% 높고 수명은 평균 4년 정도 단축된다고 한다.
영국의 한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남자 8,500명 중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사랑합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사람이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보다 2배정도 빨리 회복되었다고 한다. 또한 유방암을 앓고 있는 1000명의 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사랑합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사람이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보다 5년 후에 생존해 있을 확률이 2배정도 높다고 한다.
이렇듯 수많은 임상 연구들이 남편과 아내,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데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21세기는 ‘NQ시대’라고 한다. NQ(Network Quotient, 이하 공존지수)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나타내는 ‘공존지수’다. 공존지수는 노후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버드의대에서 193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건강과 행복에 관한 추적조사연구가 있다. 2003년부터 이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로버트 왈딩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첫째 ‘안정된 결혼생활’을 포함하는 좋은 인간관계이며, 둘째 좋은 인간관계는 양(量)보다 질(質)이며, 셋째 좋은 인간관계는 몸과 마음 뿐 아니라 두뇌도 보호한다”고 밝혔다.
미시간대 심리학과의 로버트 칸과 토니 안토누치 교수의 호위대 모델(convoy model)을 인용(引用)한다. 호위대 모델은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노후의 건강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 모델은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 즉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보여준다. 먼저 4개의 동심원을 그리고, 가장 안쪽 원에는 ‘나’를 적는다. 두 번째 원에는 소위 ‘1차 네트워크’인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친밀한 사람들을 적는데,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 원에는 소위 ‘2차 네트워크’로 1차 네트워크만큼은 아니지만 친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적는다. 대개 학교 동창이나 동네 이웃, 지인들로 구성된다. 가장 바깥 원에는 소위 ‘3차 네트워크’인 직장이나 공적인 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을 적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 하는 것이다.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 원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이 원 안에 있을 사람들, 내 곁에서 인생의 호위무사(護衛武士)가 되어줄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점검하다 보면, 직장을 다니는 현역시절에는 3차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하면 가장 빨리 소멸하는 과정을 밟는다. 은퇴 후 2차 네트워크도 흔들린다. 동창 모임이나 지인 모임에 나가도 자기와 형편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은퇴 후 나이 들수록 중요한 관계는 바로 1차 네트워크인 가족관계,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부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 부부간의 공존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부부가 서로 바라는 노후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함께 설계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부부의 인생계획 중 부모로서 세운 계획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부부 중심의 삶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100세 시대’이다. 대개 환갑에 이르면 수명을 다했던 시절에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자식을 키워 시집·장가보내면 인생도 거의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을 독립시킨 후에도 부부가 함께 30~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 설계가 필요하다.
은퇴 후 행복한 부부생활은 부부 두 사람이 그리는 노후가 동상이몽(同牀異夢)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은퇴 후 삶에서 부부 각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은퇴 후에 어디서 살고 싶은지, 부부 각자가 꿈꾸는 삶의 모습을 서로 확인하고 그 간격을 좁혀나가야 한다.
둘째, 배우자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가족학자들은 나이 들수록 부부 사이에 우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가슴 떨리는 뜨거운 열정은 쉽게 무뎌지지만 따뜻한 우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서 함께 사는 행복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부부간에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은퇴 후 부부들이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영역이 가사분담 문제다. 특히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들이 퇴직 후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들을 하루 종일 뒤치다꺼리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퇴직남편재가 증후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은퇴 후 부부는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 자녀양육자로서의 역할 등을 마치면서, 새로운 역할조정의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 이때 부부는 ‘남편의 일’ 혹은 ‘아내의 일’을 고수하기보다는 집안일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돌봄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
아내는 지금까지 땀 흘리며 수고한 남편을 인정하고, 은퇴 후 집안에서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얘기해보자. 남편은 아내도 집안일에서 은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가사 일을 하는 것은 남자로서 자존심 구기는 일이 아니라, 아내의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아내를 돌보는 일이다. 매일의 삶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는 돌봄의 능력이야말로 100세 시대의 부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부부 사이의 안녕(安寧)이 노후의 안녕이자 행복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올해 분야별 주요 청사진 제시](/news/data/20260122/p1160279175155979_90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강도 주차장 정비계획 안정화 단계](/news/data/20260121/p1160278837266287_320_h2.jpg)
![[로컬거버넌스] 강범석 인천시 서구청장, 새해 구정 청사진 제시](/news/data/20260119/p116027880947002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공간·교통 분야 혁신 박차](/news/data/20260118/p1160285211793310_623_h2.jpg)





